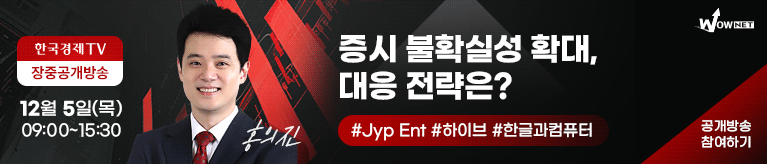우리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7.7%나 줄었다. 감소폭이 3분기(-7%)보다 커지면서 2003년 이 통계를 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바로 위 20%(2분위) 소득 역시 1년 새 4.8% 줄었다.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간 계층(3분위)은 소폭(1.8%)이나마 늘었고, 최상위 5분위는 10.4% 증가했다.
현상으로만 보면 도식적인 ‘양극화’에 대한 우려나 비판이 나오기에 딱 알맞다. 그러나 격차가 심화된 이면에 도사린 본질과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그것이다. 저소득 계층이 눈에 띌 정도로 추락하는 현실을 냉철히 보고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된 대안과 해법이 가능해진다.
1분위 가계의 소득이 급감한 주 원인은 37%나 줄어든 근로소득이었다. 통상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게 저소득층의 특성이다. 악화돼온 일자리 감소의 충격파가 이 계층을 주로 덮쳤음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 악화가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통계청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용 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기저효과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탓이니 하는 변명 같은 분석을 되풀이하다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올 들어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 와중에 경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산층의 기반을 흔드는 빈익빈은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다.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기존의 몇몇 대책을 점검했다지만 이 정도로 풀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위기 극복을 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못한 채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공약이라면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소득이 급감한 1분위(월평균 123만8000원), 2분위(277만3000원)에 포함된 공기업·대기업 근로자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대 노총에 휘둘려온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이 어느 계층의 기득권을 다졌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 뒷받침 없는 설계주의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위기로 급부상한 빈익빈을 막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는 사실에 입각해 규제혁파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관점의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 시장의 자유와 기업 자율을 보장해야 좋은 일자리도 나오고, 고용 확대로 소득분배도 개선될 것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