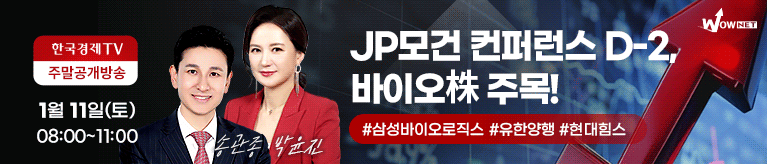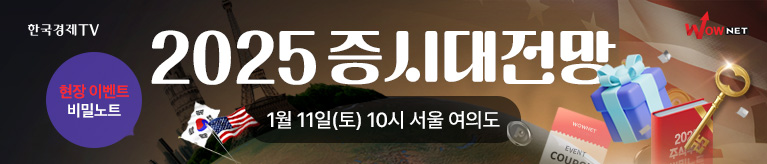한국과 달리 일본 공영방송 NHK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신상보다 묵직한 외교·경제 이슈가 자주 등장한다.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은 19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공장 근로자들이 해머로 일본산 자동차를 부수고, 땅에 파묻는 ‘일본 차 장례식’ 모습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 공영방송 NHK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신상보다 묵직한 외교·경제 이슈가 자주 등장한다.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은 19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공장 근로자들이 해머로 일본산 자동차를 부수고, 땅에 파묻는 ‘일본 차 장례식’ 모습이다.30년 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미국인들을 본 방송 사회자와 패널들은 모두 “아~”라는 짧은 탄식만 내뱉는다. 미국에 대한 비판도, 자국 기업에 대한 연민과 변명도 없이 그저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경각심은 높이되 정부의 대응책을 굳게 믿기 때문일까.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가 곤두박질친 경험이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오랜 통상 마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공격적인 한마디를 내놓을 때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비굴하다’고 비칠 정도로 미국과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 공세에서 일본은 상대적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발동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물론 최근 꺼내든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또는 수입량 할당)’ 공세를 비껴갔다. 같은 동맹관계이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난타당한 것과는 대조된다.
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동맹국에도 비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혹시나 모를 추가 공세에 대비했다. ‘저자세적’이면서도 실리를 확보하는 자국 정부의 30여 년 대미 통상 노하우를 탓하는 일본인들은 보기 드물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일 미국을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는 태세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엔 ‘결연히’ 대응했다는 기억을 남겨주지 못한 정부다. 대미 강경모드가 ‘무데뽀(無鐵砲)’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랄 뿐이다.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