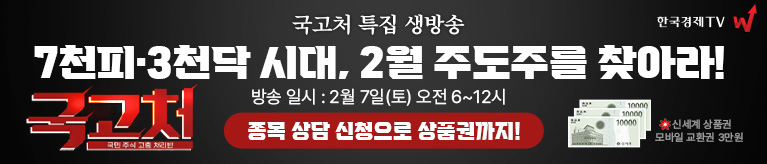프랑스는 유럽연합(EU) 주요국 가운데 대량 실업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청년실업률이 20%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경제성장률은 수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탓이 크다. 마크롱은 노사정위원회나 국회를 거치는 노동개혁 대신 행정부가 단독으로 법률명령을 발동하는 속전속결 방식을 택했다. 노동개혁이 워낙 시급한 데다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한때 60%를 넘던 마크롱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졌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다 총파업 참여 인원도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며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마크롱의 태도가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프랑스의 노동개혁은 한국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새 정부는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노동시장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양대 지침’ 폐기가 대표적이다.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달 폐기될 운명이다.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도 노동개혁에는 역행한다.
프랑스 역사가 장 세리오는 ‘국민 타성을 깨는 지도자의 에너지’를 노동개혁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에는 언제쯤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