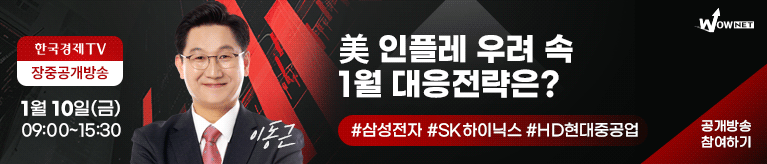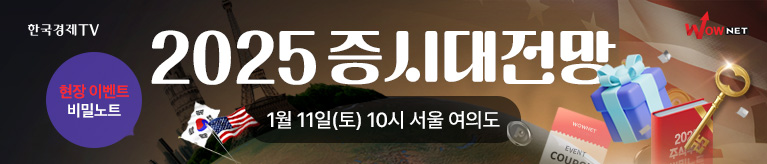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노동이사 2명을 임명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5월 정원 1만5674명의 단일 공기업으로 통합된 데 이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까지 활동함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양대 지하철 통합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통합 제안을 노조가 선뜻 받아들인 이면의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시와 노조의 ‘정치적 거래’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노동이사는 3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노사 협력과 상생의 새 경영 패러다임을 촉진할 것”이라고 2명의 임명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상당수 학계의 견해는 다르다. 그간 여러 차례 열린 토론회와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주주 우선 원칙 훼손, 노사갈등을 부추길 가능성,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 법적 근거 부족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독일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독일은 기업 선택에 맡겨져 있다. 게다가 독일 기업들이 요즘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하르츠 개혁’ 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 노동계의 짙은 정치 성향은 이 제도를 더욱 경계하게 한다. 서울 지하철의 신규 노동이사들은 각각 민주노총공공연맹 간부와 도시철도노조 정치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 리더들이다. 노사관계를 정치 프레임에 더 몰아넣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재계의 의구심이 커지는 현실적 이유다.
광주광역시와 경기 성남시도 노동이사제를 검토 중이다. KB금융 계열 7개사 노조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을 이사로 선임하라고 경영진을 압박한 일도 있었다.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경계하는 재계의 걱정은 과장이 아니다. 노사관계가 너무 급격히 변해 ‘노영(勞營)체제’로 변질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해외자본의 투자 이탈 정도가 아닐 것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