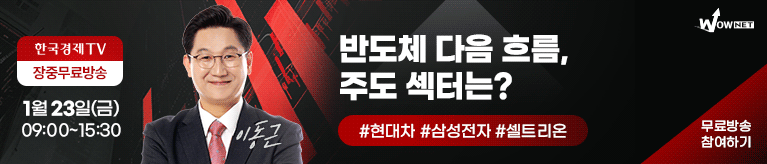국내에 자기자본 8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자 증권업계의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의 새주인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수준의 자본력을 확보해서다.
24일 KDB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우증권의 새주인(우선협상대상자)으로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4위 미래에셋증권(자기자본 3조4620억원·증자 후 기준)이 2위인 대우증권(4조3967억원)을 품에 안으면서 합병회사는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단순합산한 자기자본 기준 7조8687억원 규모다. 현재 1위인 NH투자증권(4조6044억원)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삼성증권(3위·3조6285억원)과 한국투자증권(5위·3조3739억원)보다는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경쟁 구도가 '확'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인수·합병(M&A)으로 인해 경쟁 증권사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대형 증권사들도 투자은행(IB)으�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만 한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국내 IB 분야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선두 증권사고,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이 뛰어나다"며 "규모 면에서 국내 1위가 되는 것은 물론 사업적으로 서로 보완, 시너지(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만 실제 합병 이후 효과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자기자본 규모가 단순 합산한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설명. 합병 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 역시 빠지지 않고 눈에 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단순 합산 자기자본 규모는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합병 후 자본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며 "이번 인수를 위해 추가 자금조달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추가 차입을 감안한 예상 자기자본은 5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추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현금성자산을 포함한 보유현금은 3715억원(3분기 기준)으로 지난달 증자를 고려하면 인수자금 2조4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5일 대우증권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유증을 통해 9561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당초 목표한 1조2000억원에는 2500억원가량 부족했다.
전 연구원은 "투자자산 처분 등을 포함해 차입자금을 8000억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연간 예상 이자비용만 2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