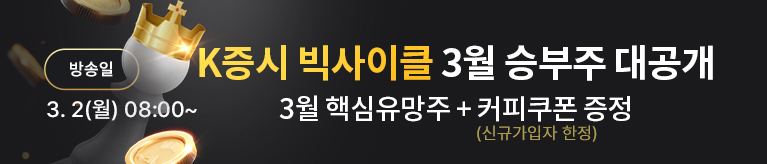차이가 성장 빚고 성장이 차이 줄여
선순환의 효율성을 주목해야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chyun3344@daum.net >
 올해 A는 100을 생산해냈고 B는 200을 생산했다. 그러자 새로 집권한 정부는 100% 세율을 적용해 산출 300을 모두 세금으로 걷은 후 A와 B에게 300의 반(半)에 해당하는 150씩 나눠줬다. 산출액은 다르지만 소득은 150으로 같아졌다. 완전한 소득 평등이 실현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연도다. 문제는 역시 B다. 자신은 200을 만들었는데 100을 만든 A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B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A는 100을 생산해냈고 B는 200을 생산했다. 그러자 새로 집권한 정부는 100% 세율을 적용해 산출 300을 모두 세금으로 걷은 후 A와 B에게 300의 반(半)에 해당하는 150씩 나눠줬다. 산출액은 다르지만 소득은 150으로 같아졌다. 완전한 소득 평등이 실현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연도다. 문제는 역시 B다. 자신은 200을 만들었는데 100을 만든 A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B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만일 B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그는 그 다음 해에 150만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A가 100을 생산한다 해도 전체 소득은 250으로 줄어들고 둘 다 모두 125씩 지급받는다. 소득이 25씩 줄었다. 그러나 B의 소득은 125로 여전히 자신이 산출해낸 150보다 적다. 2년차에 가면 B의 산출은 더 줄어들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 경우 A가 B를 보며 실망하고 산출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A가 더 노력해서 B를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B는 산출을 줄일 가능성이 훨씬 큰 반면 A는 산출을 줄일 가능성과 늘릴 가능성이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기업에서는 확실하게 가능하다.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것이 바로 이런 동력이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와 B의 반응에 대해 간단한 가정을 한 셈이지만 소득분배와 관련한 논의는 너무도 복잡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아울러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봐야 한다는 점이다. 형평성만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가치도 경제 운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불평등의 존재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위의 예에서 양쪽 다 150씩 받으면서 소득 차이가 0이 되는 경우 완전한 형평성이 달성되지만 B가 노력을 게을리하게 돼 효율성은 최소화된다. 반대로 A가 100, B가 200을 받아서 소득 차이가 100인 경우 형평성 수준은 최악이 되므로 이 또한 균형점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사후 소득의 차이를 조절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이 변할 것이고 결국 균형점에서 소득 차이는 0과 100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균형점에서 소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균형점에서 관찰되는 소득 차이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적당하게 잘 균형을 이루는 차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소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최근 노벨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교수가 지적한 ‘좋은 불평등’의 의미일 것이다. 즉 불평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내에서 파이가 커지면 나눌 것이 많아지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경우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모든 불평등 자체가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님이 자명하다.
수많은 인류가 중산층이 되면서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형평성만이 아니라 효율성의 추구에 의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형평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득불평등 옹호론자’라고 매도한다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로 ‘빈곤 옹호론자’라는 역비판도 가능해진다.
사후적 소득이 동일해지면 노력하려는 유인체계가 무너진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가슴 뜨거운 명제를 제시한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형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효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키움’과 ‘나눔’ 간에는 조화가 중요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세상에 누가 불평등 자체를 좋아하겠는가. 불평등은 ‘극복’의 대상이지 ‘선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chyun3344@daum.net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