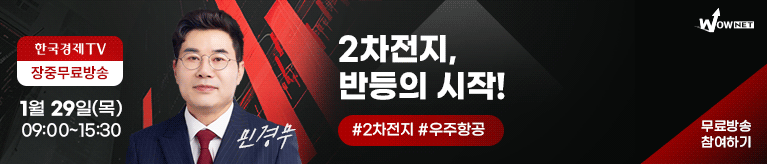21세 때 부모 뜻 이어 한국 찾아 59년째 '입양아동들의 대모'로
독신으로 살아왔지만 후회 없어…골수암 진단 후에도 꾸준히 활동
[ 이미아 기자 ]
 “말리 언니, 저 왔어요! 카네이션 예쁘죠?”
“말리 언니, 저 왔어요! 카네이션 예쁘죠?”어버이날인 지난 8일, 입양의 날(11일)을 사흘 앞두고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 안의 ‘말리의 집’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홀트아동복지회의 말리 홀트 이사장(80)을 찾아온 국내외 입양자와 복지타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다. 홀트 이사장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지은 지 53년 된 66㎡(약 20평)짜리 아담한 주택이다.
홀트 이사장은 이날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다. 그는 “팔순 된 할머니한테 ‘언니’라고 하니 이상하겠지만 여기선 나를 그렇게 부른다”며 “이맘때가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거나 편지, 사진을 보내주는 입양아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한국에 온 지 60년이 되는 그의 한국어 실력은 옆집 할머니처럼 정겹게 들릴 정도로 능숙하다.
1935년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부부의 둘째 딸로 태어난 홀트 이사장은 1956년 21세 나이로 한국에 왔다. 오리건 주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부자였던 해리 홀트는 우연히 한국의 6·25전쟁 고아 참상을 전달하는 영상을 본 뒤 한국인 고아 8명을 입양하고, 한국에 건너와 입양전문 복지단체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했다. 홀트 이사장이 새크래드 하트 간호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한국 땅을 밟은 것도 부모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였다.
‘한국 입양아들의 대모’로 살아온 지 어느덧 59년째. 버려진 아이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아기 11명이 한꺼번에 우리 시설 문 앞에 버려진 적이 있다”며 “핏덩이 아기들이 바구니나 운동 가방, 비닐봉지 등에 싸여 있는 걸 보니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홀트 이사장은 “입양은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나와 우리 단체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해외에 팔아먹는 인간’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7년 도입된 해외 입양 쿼터제(연도별로 해외 입양 아동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비롯한 한국의 입양 관련 법률들은 국내 입양을 권장한다”며 “법률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입양에 대한 인식은 60년이 흘러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입양은 한국에서 일종의 스티그마(stigma·낙인)”라고 털어놨다. 입양하려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단다. 홀트 이사장은 “외국인들은 정말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장애나 질병을 앓는 아이가 아니라면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데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인들은 입양 아동에 대해 내세우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외모가 예뻐야 하고,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혈액형까지 따지며 장애아동 입양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설을 전전하며 불행하게 사느니 해외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나의 트렌드가 된 공개입양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공개입양을 하는 열린 사고방식은 환영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아이는 입양아라는 이유로 왕따가 된다”며 “어떤 결정이든 아이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홀트 이사장은 2년 전 골수암 진단을 받은 뒤 대외 활동을 줄였다. 하지만 복지타운 내 생활자를 보살피는 일과 복지회 관련 활동이라면 꾸준히 나서고 있다. 입양 아동들을 돌보는 새 정작 자신은 독신으로 지냈다. 그는 “나를 엄마나 언니라고 불러 주는 수만명의 입양아가 있다”며 “그것이면 족한 일 아니겠냐”고 웃으며 답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