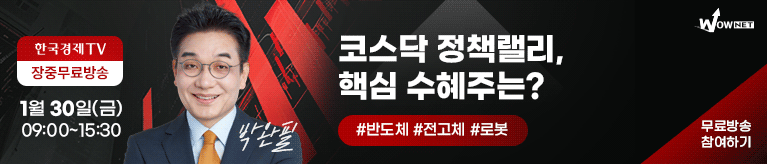과잉 규제가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의 시장진입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특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규제의 이면에는 기득권이라는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정권마다 출범 초엔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혁파를 외치고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1998년 1만372개였던 규제건수는 작년 말 1만3914개로 오히려 늘었다. 올 들어서도 456개가 폐지되고 1338개가 신설됐다. 하나를 없애면 두 개가 생기는 규제의 자가증식이요 세포분열이다.
규제 건수도 문제지만 규제의 질적인 개선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수다. 선진국일수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공무원이 틀어쥔 인허가권과 처벌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요원하다. 정부가 총론에서 입지 규제를 풀어도 각론에서 환경, 교통, 재해예방, 보건, 노동 등 지자체의 규제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부작용은 아랑곳않고 쏟아지는 국회의원들의 과잉 입법에 의한 규제다. 작년 7월 출범한 19대 국회에선 358건의 기업 규제법안이 발의됐으니 하루 한 건꼴이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 등의 간판을 내걸 때마다 덩어리 규제폭탄이 떨어진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줄지 않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위였지만 정부규제 부담은 144개국 중 117위였다.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해보겠다는 기업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오빠! 용돈 600만원씩 줄거지?" 다짜고짜…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女배우, 부모님 몰래 '초고속 결혼'하더니…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