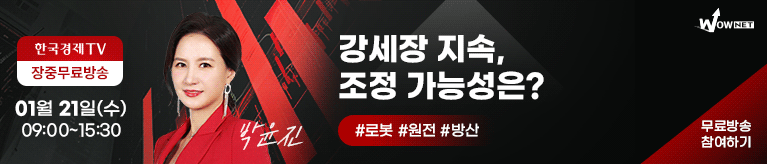펜스, 침입 시작 14분 후 대피…"펜스 목 매달아라" 시위대와 불과 30m거리
검찰 "납치살해조 직접증거 없어"…법원에 '납치·암살 계획' 대목 삭제요청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칫 '폭도'들에게 붙잡힐 뻔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은 시위대가 의사당에 들이닥치자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결과 뒤집기' 지시를 거부하면서 지지자들의 분노를 산 상태였다. 자칫 몇분만 늦게 피신했어도 미 행정부의 이인자가 성난 폭도들의 표적이 되면서 신변상의 위험에 처했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던 셈이다.
WP는 펜스 부통령은 의사당 침입 시도가 처음 일어난 지 14분이 지나서야 대피했고, 시위대로부터 100피트(약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신문은 치안 당국자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
스티븐 선드 의회경찰국장은 당일 오후 1시 59분께 시위대가 의사당 문에 다다라 창문을 부수려 한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다.
이후 오후 2시 11분께 일부가 나뭇조각으로 창문을 부수는 모습이 포착됐다. 1분 후 한 시위대가 창문으로 의사당에 진입했다.
오후 2시 13분께 펜스 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떨어진 방으로 대피했다. 시위대가 의사당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 지 14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시위대가 계단을 올라 본회의장 인근에 도착한 건 1분 후인 2시 14분이었다.
펜스 부통령의 대피처는 이들과 100피트(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위대가 몇 초만 일찍 도착했어도 펜스 부통령이 이들의 시야 안에 들어왔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의사당에 들이닥친 이들 대다수는 합동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를 거부한 펜스 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들은 건물에 들어서며 "펜스의 목을 매달아라"라고 단체로 외치기도 했다.
당시 뿔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채 활보해 '큐어넌 샤먼(주술사)'으로 알려진 제이컵 챈슬리는 본회의장 내 펜스 부통령 책상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WP는 펜스 부통령의 대피가 지연된 점, 그가 시위대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비밀경호국이 왜 그를 더 일찍 이동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며 "사태 당시 최고위 당국자들이 처했던 위험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법원 제출 문건을 근거로 시위대가 펜스 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검찰은 뒤늦게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며 한발 물러서기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벤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 당국은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 일부가 펜스 부통령의 납치와 암살을 계획한 점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태가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며 "그들은 그저 술에 취해 거칠게 행동한 게 아니라, 헌법에 의무화된 권력 교체 과정을 공격한 테러범들이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새스 의원은 앞서 애리조나주 연방검찰이 공개한 법원 서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새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애리조나주 연방검찰은 챈슬리의 구금을 요청하기 위한 법원 서류에서 "의사당에서 챈슬리의 말과 행동을 포함해 강력한 증거들은 의사당 폭도의 의도가 선출직 공무원을 포로로 잡아 암살하려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이 펜스라고 특정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납치·살해조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몇 시간 후 애리조나주 연방검찰도 공판 도중 서류에서 해당 문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