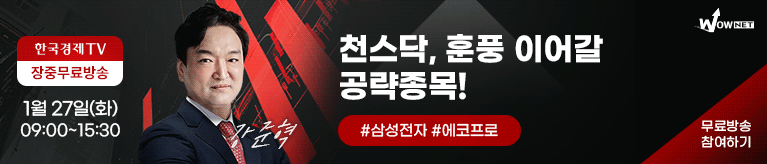노사민정協, 노동계 의견 수용해 유예 조항 삭제한 협상안 마련
현대차, 경영안정 위해 유예 명시 고수해 협상 안갯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이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중대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35만대 생산때까지 임금·단체협상 유예'를 두고 또다시 협상안이 뒤집히면서 협상이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4일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에 임금(초봉) 3천500만원 보장, 자동차 생산 규모 연간 10만대 규정 등에 합의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설법인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안을 넣었다.
당초 지난 6월 현대차와 맺은 투자협약안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생산 규모 등은 같았고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단체협상을 유예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는 임단협이 유예되면 임금이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 조항이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근참법 제12조와 20조에서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협의회는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게 돼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자 시 협상단은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을 '당초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쳐 확정한다'고 협상안을 바꿨다.
임단협 유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 노사 분쟁 등을 우려한 현대차가 임단협 유예를 협약서에 넣을 것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협상단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27일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현대차와 재협상을 해 35만대 달성까지 임단협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넣었다.
협상 무산 위기에 몰린 협상단은 '5년간 유예' 조항을' '35만대 달성까지'로 바꿔 접점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전권을 위임한 노동계가 협상 내용이 공개되자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앞두고 이 유예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또다시 협상이 꼬이게 됐다.
노동계는 연간 10만대 생산이 목표지만 초기에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35만대 생산 달성까지라는 조항은 사실상 5년간 임단협 유예라고 해석하고 있다.
협상단은 이날 다시 노동계와 논의해 '35만대 달성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노동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단협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현대차와의 협상안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가 불참하면 노사민정 합의라는 틀이 깨지고, 결국 현대차 투자 협상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는 경영안정을 위해 '임단협 유예'라는 조항이 반드시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6일 예정인 최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노동계(한국노총)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안이 최종안으로 더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5만대 물량을 정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며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협의회에서 나온 임단협 유예 관련 안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더는 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현대차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구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