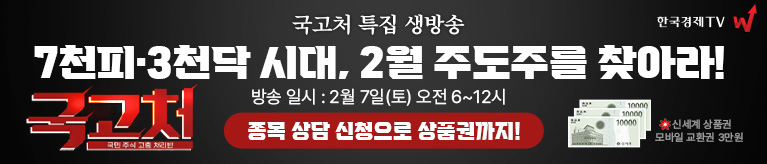박석기·노민상 "꾸준한 속도 유지가 남은 과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박태환(28·인천시청)이 6년 만에 출전한 롱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옛 스승들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박태환은 24일 오전(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38에 레이스를 마쳐 4위를 차지했다.
올해 세계랭킹 1위 쑨양(중국·3분41초38)이 대회 3연패를 이뤘고,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 호튼(호주·3분43초85)과 동메달리스트 가브리엘 데티(이탈리아·3분43초93)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애초 수영 전문가들이 예상한 선수들이 메달을 나눠 가졌다.
박태환은 데티에게 0.45초 뒤져 시상대 위에 서지 못했다.
이날 레이스에서 박태환의 시작과 끝은 좋았다.
결승에 오른 8명 중 가장 빠른 출발반응속도(0.62초)로 물에 뛰어든 박태환은 첫 50m 구간을 2위(25초82초)로 헤엄친 뒤 100m 구간을 돌 때는 1위로 치고 나섰다.
하지만 200m 이후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입상권에서 밀려나더니 마지막 50m 구간에서는 특유의 폭발적 스퍼트로 26초43의 가장 빠른 기록을 내고도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자유형 400m는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와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박태환의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종목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의 주 종목이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박태환의 옛 스승들은 재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그의 역영에 박수를 보냈다.


2007년 멜버른 대회 당시 박태환을 지도했던 박석기 전 대표팀 감독은 "2007년의 페이스를 회복하는 듯해서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태환을 수영선수로 키우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일궈낸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도 "아쉬움보다는 여러 상처를 딛고 계속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인한 선수 자격 정지 징계에 이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등에 묶여 2년 가까이 공백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쓴맛만 단단히 봤다.
그의 나이를 고려해 '박태환의 시대는 이제 저무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이후 아시아선수권대회,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잇달아 건재를 과시하며 이번 세계대회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자유형 400m 출전 선수 52명 중 최고령이다.
1980년대생이라고는 박태환과 같은 나이인 이라클리 레비시빌리(조지아)와 둘 뿐이었다. 20대 초반의 선수가 주름잡는 세계수영계에서 박태환은 그들과 대등한 레이스를 펼쳤다.
다만 중간 레이스가 처진 것에 대해 옛 스승들은 그동안의 시련 때문에 의욕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노 전 감독은 "지지 않겠다는 의욕이 너무 넘쳤다.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박 전 감독도 "예선 때처럼 안배를 해야 했다. 의욕이 앞서 초반에 페이스가 지나치면 후반에 데미지가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아마도 초반에 치고 나가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리라 생각한 것 같다"고 심리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
세계수영의 흐름도 다시 확인했다.
훈련 방법의 과학화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갈수록 좋아져 중거리 경기에서도 근지구력은 물론 스피드지구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자유형 400m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꾸준하게 더 속도를 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된 지 오래다.
노 전 감독은 "400m 레이스에서도 전, 후반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단거리, 장거리 선수 할 것 없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감독은 "축구 스타 박지성은 90분 내내 끊임없이 경기장을 달리고, 케이티 러데키(미국)는 여자 자유형 800m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속도로 헤엄친다"라면서 "오래 전부터 이런 훈련을 해온 박태환도 점점 몸이 기억하는 레이스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