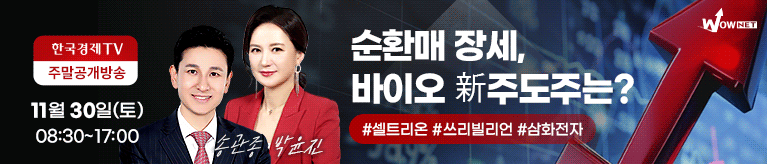<앵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워낙 많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 이권 다툼 속에 피해를 보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아기를 키우는 시각장애인 조 씨.
아기가 아파 찾아간 응급실에서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지만, 실손의료보험을 믿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병원을 다시 방문해 응급실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갖가지 자료를 받아오라는 요청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현영 시각장애인
"(담당) 부서는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저희 남편도 시각장애인이라 누구한테 또 봐달라고 해야하는데, 서류를 받아온다 해도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또 다른 시각장애인 김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매번 찾아와 청구 서류를 받아 가는데, 한 번에 청구하려고 쌓아두다 보니 서류가 분실되기 일쑤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배려를 했다가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청구조차 못한 겁니다.
국민 3천3백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매번 환자가 각종 서류를 떼야 하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권타툼으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병원이 보험사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민간 보험과 소비자 간의 계약에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보험사와 해결해야죠. 국민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걸 의사한테 대행하고 돈 받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수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