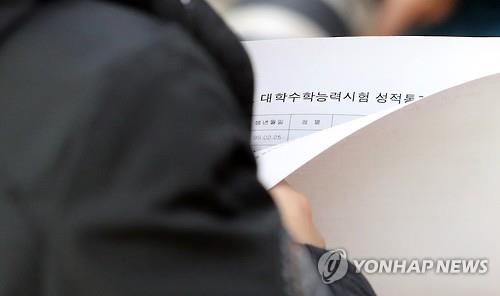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각 대학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교육부는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며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강조했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천944명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입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이번 조처를 입시에 적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적잖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어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정·수시 분리 상태에서는 수시모집과 수능을 확실히 나누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능 최저 폐지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