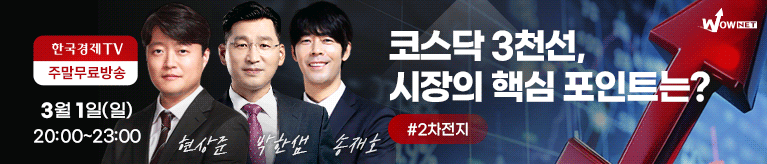가무극 ‘뿌리 깊은 나무’는 2006년 출간된 이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소설은 발간 당시 ‘방대한 지식과 치밀한 픽션을 가미한 걸출한 한국형 팩션’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품은 드라마와 연극으로도 제작됐다. 특히, 드라마는 최고시청률 25.4%를 기록하며 전국에 ‘뿌나 신드롬’을 일으켰다. 가무극은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서울예술단이 원작 소설의 뼈대를 빌려 제작했다.
한글, 세종이 세운 ‘조선의 집’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했다. 인간을 언어라는 집에 사는 파수꾼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허름하면 덩달아 집도 너덜해진다. 그 집에 사는 ‘나’ 또한 타인의 눈에 누더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 복속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어는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숱한 권력자들은 백성의 ‘우민화’를 위해 ‘문자’의 사용을 억압해 왔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왔다. 한자로 된 토지 문서에 무어라 적혔는지도 모른 채 수결을 했다가 땅을 빼앗기고 노비가 됐던 조선 농민들의 울분도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언어를 갖는 것과 빌리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간격이 그만큼이나 넓고 시리다.
‘뿌리 깊은 나무’의 핵심은 바로 ‘언어의 속성’에 있다. 대부분의 언어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돼 왔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한글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한글을 만들고자 했을까. 가무극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이유에 웅숭깊은 시선을 던진다.
조선은 대륙에 기대어 세워진 나라다. 그 시작이 ‘명’에 대한 사대였으니, ‘자립’이 불허된 나라이기도 했다. 가무극 ‘뿌리 깊은 나무’ 속 세종은 불허된 ‘조선의 자립’을 언어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가 꿈 꾼 것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이에 대한 세종의 마음을 잘 대변한 대사 하나가 있다. “새로운 글자에는 새로운 혼이 있으니 백성이 글을 익히면 이제와는 다른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조선의 세상이 올 것이다.” 세종은 남의 집에 기대어 살던 조선인에게 ‘한글’이라는 튼튼한 독립채의 지붕을 얹어 준 것이다.
작품의 1막과 2막은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갖고 있다. 1막은 분산된 추리의 파편들을 한군데 뭉치지 못한다. 살인사건을 파고들어가는 채윤의 추동력이나, 사건의 정황을 섬세하게 파고들어가는 서스펜스도 약하다. 빠르게 스치는 대사들은 미약하게 관객의 이성을 건드리고 지나갈 뿐이다. 채윤과 소이의 러브스토리는 그의 전반에 녹아들지 못해 산만한 느낌을 준다.
2막은 1막의 아쉬움을 다방면에서 감싸 안는다. 2막은 세종이 품어 왔던 ‘원대한 꿈’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전체적인 리듬이 되살아난다. 무휼과 병사들의 훈련이나 세종과 채윤, 소이가 적들을 대적하는 장면의 액션신 등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도 다채롭다. 특히, 과거 세종과 무휼의 사연이 현재의 세종과 무휼로 오버랩되며 서서히 드러나는 ‘조선의 상처’는 전체 작품의 백미로 꼽을 만큼 처연하고 아름답다.

‘신념의 인간’들을 들여다 보다
가무극 ‘뿌리 깊은 나무’는 원작에 비해 추리적 재미가 약하다. 작품은 채윤의 수사를 돕던 인물들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성삼문’에게 집중시켰다.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자연히 초점은 세종이 ‘고군통서’를 찾는 이유로 옮겨진다. 켜켜이 쌓여 있던 추리의 단서를 파헤쳐 가는 재미는 원작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한글 창제를 꿈 꾼 ‘세종의 울림’은 더욱 견고해졌다.
가무극 ‘뿌리 깊은 나무’의 또 다른 닻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글 창제’에 대한 세종의 굳건한 의지, ‘고군통서’를 지키려 목숨을 잃은 집현전 학자들, 세종의 곁을 우직하게 지키는 무휼, 세종의 길을 막고자 하는 최만리 등은 모두 자신의 신념을 따라 움직인다.
무휼의 죽음은 ‘신념의 인간’을 보여주는 정점이다. 그는 ‘고군통서’와 세종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자처한다. 입고 있던 옷에 닳도록 외웠던 ‘고군통서’를 옮겨 적으며 부르는 단 한 곡의 솔로곡은 ‘신념’이 주는 감동 그대로를 객석에 비춰낸다.
‘세종’ 역을 맡은 서범석의 존재감은 우뚝하다.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극장 안을 감싸는 카리스마는 세종과 닮아 보이기까지 한다. 온화하지만 단호한 말투, 소리의 풍부함도 객석 전체를 압도한다. 서울예술단원들의 탄탄한 내공은 공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채윤 역의 김도빈은 예술단을 이끌어나갈 배우로서의 주연 신고식을 차분히 치러냈다. 무휼 역의 박영수, 가리온 역의 김백현 등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믿음직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