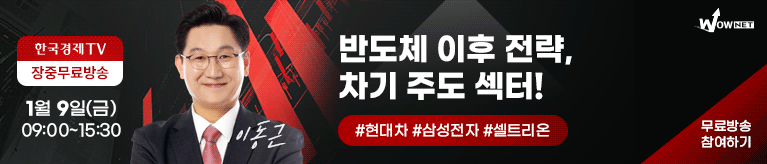어린 시절 여동생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팔뚝. 사이렌처럼 울려 퍼진 동생의 울음소리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잘못한 걸 아는지 한쪽 구석에 쭈그러져 있던 강아지. 아주머니는 그 녀석의 꼬리 털을 잘라 불에 태운 뒤 상처에 골고루 발랐다. “걱정 마. 이제 괜찮을 거야!” 동생은 울음을 그쳤고, 동네발 공습경보는 그렇게 해제됐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길 하면 젊은 후배들이 묻는다.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냐고. 하지만 네이버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시절엔 전국적으로 꽤 퍼져 있던 민간요법이었음을.
어린 시절 여동생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팔뚝. 사이렌처럼 울려 퍼진 동생의 울음소리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잘못한 걸 아는지 한쪽 구석에 쭈그러져 있던 강아지. 아주머니는 그 녀석의 꼬리 털을 잘라 불에 태운 뒤 상처에 골고루 발랐다. “걱정 마. 이제 괜찮을 거야!” 동생은 울음을 그쳤고, 동네발 공습경보는 그렇게 해제됐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길 하면 젊은 후배들이 묻는다.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냐고. 하지만 네이버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시절엔 전국적으로 꽤 퍼져 있던 민간요법이었음을.1000년쯤 전엔 동일한 질병이라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달랐다. 중세 시대 유럽에 거주했다면 평소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성지순례를 떠났을 것이다. 전염병이라도 퍼지면 동네에 적당한 마녀를 찾아내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냄새가 고약한 정체불명의 물약이 동원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검은 수탉의 피를 환자의 몸에 뿌렸다.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있는 이런 ‘돌팔이 요법’은 의외로 생명력이 끈질기다. 질병과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요즘에도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과학의 그늘에 숨어 있다가 빈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내민다. 현대판 ‘사이비 의학’의 파괴력을 높이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저명인사의 지지와 음모론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는 오랫동안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백신에 들어간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합물인 티메로살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논리였다. 미국 의학연구소 등 권위 있는 의학단체들이 줄줄이 반박에 나섰지만, “제약회사가 정치 세력과 결탁해 백신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음모론을 몰아내진 못했다.
누구든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골치 아픈 과학적 설명보다는 으슥한 곳에 모여 모략을 꾸미는 권력자들의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법이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우신스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9·11 테러를 미국 행정부의 ‘내부 소행’이라고 믿고 있고, 10% 정도의 사람은 미국 정부와 항공사가 손잡고 비행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독성 물질을 살포하고 있다는 이른바 ‘켐트레일 음모론’을 ‘완전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응답자의 4% 정도는 얼굴 모습을 인간으로 바꾼 파충류가 비밀리에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미녀 다이애나가 사실은 도마뱀 얼굴을 한 외계인이었다는, 1980년대 드라마 ‘브이(V)’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미국인이 어림잡아 1000만 명 정도나 된다는 얘기다.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미국 보건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기후 변화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해 온 크리스 라이트라는 인물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비슷한 맥락의 걱정을 낳는다. 음모론을 믿는 건 개인의 자유라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레벨이 다른 얘기다. 정책 변경의 파장이 쉽게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도 영향권 밖일 순 없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남의 나라 장관 인선에 유독 관심이 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