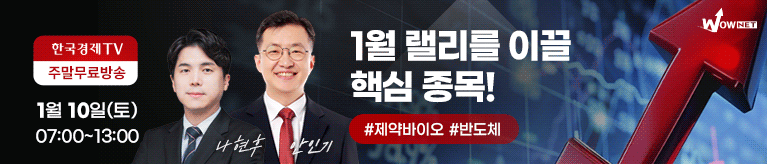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죽음은 모든 생명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어서 철학과 종교의 기반이 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로,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말이라고 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죽음은 모든 생명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어서 철학과 종교의 기반이 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로,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말이라고 한다.우리는 가능하면 죽음을 외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존엄사가 사회의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도 있다. 프랑스 영화계의 새 흐름 ‘누벨바그’를 이끈 장뤼크 고다르 감독은 92세로 별세할 때, 앓고 있던 불치성 질환의 고통 때문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택했다. 존엄하게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시그리드 누네즈의 소설 <어떻게 지내요>에는 말기 암 진단 후 시한부 인생이 돼 고통스러운 치료를 이어가던 주인공이 등장한다. 존엄하게 죽기를 소망했지만 가족과 소원해 친구에게 죽는 날까지 얼마 동안 옆방에서 자신의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스페인의 거장 알모도바르 감독이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올해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에서는 빨강과 녹색의 강렬한 색감과 도시 속 고독을 형상화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오마주한 화면에서 나타나는 고독과 공감의 대비가 돋보인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잉그리드(줄리앤 무어 분)는 신간 출판 사인회에서 옛 친구 마사(틸다 스윈턴 분)가 말기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사를 방문한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 이후 암치료의 희망 고문에 지쳐 있던 마사는 어느 날 잉그리드에게 자신의 존엄사를 위한 여행에 동행해 주기를 제안한다. 고민 끝에 그는 마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뉴욕 교외 별장으로 떠나 함께 지낸다.
“눈이 내린다. 온 우주에 희미하게 내린다. 모든 산 것과 죽은 것들 위로…”라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속 단편 ‘죽은 사람들’의 결말부 내용이 영화에서 마사의 허무한 독백으로 세 번이나 반복된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운명 앞에서 살아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잉그리드는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친구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친구가 내게 그런 부탁을 한다면 나는 수락할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 자신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면 누구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공감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살아생전 타인과의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