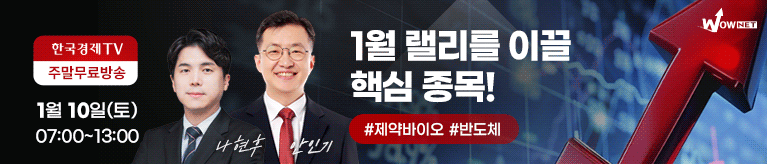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 큰 횡령 범죄자’ 대부분 감형받아

3일 한국경제신문이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횡령 판결 1224건을 분석한 결과, 50억원 횡령 시 평균 형량은 3년11개월에 그쳤다. 4~7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형사공탁이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감형받고 있으며,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가중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형 횡령’일수록 오히려 평균 형량이 가벼워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50억원 이상 횡령 시 이익 금액 5억원당 추가되는 형량은 1.7개월에 그쳤다. 반면 1억~5억원 횡령의 경우 1억원당 3.7개월이 더해졌다.
횡령 사고는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벼운 처벌에 느슨한 내부통제까지 더해지면서 횡령 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횡령 사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5년간 734억9120만원으로 최다 횡령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59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뒤를 이었다.
은행 내부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네 건 중 한 건꼴로 자체 징계로 무마하는 실정이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 59건 중 13건(22%)이 형사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종결됐다.
지난달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횡령 사고 역시 60억원가량을 폭락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횡령한 직원을 고발해도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체 징계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다”며 “횡령 사건이 터지면 은행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 횡령에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을 이날부터 의무화했다. 배임, 횡령 등 개인 일탈이라도 금융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내부통제에 실패한 임원도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은행장 등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 사고가 반복될 경우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규모는 커졌지만 판사들이 양형 시 참작하는 횡령액 상한선은 여전히 300억원에 머물러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진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횡령을 중대 범죄로 보고 배상명령과 벌금형을 병과한다”며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