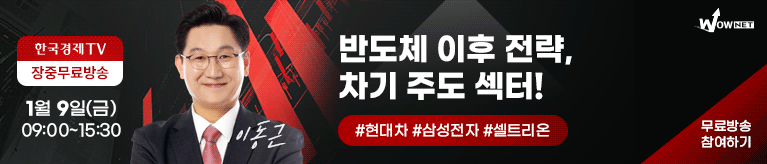세상은 무섭게 변한다. 오늘 같은 내일은 없다. 지도자가 한 발 삐끗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사법 리스크만 떼어놓으면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낙연처럼 껄끄러운 내부 경쟁자도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이 묻고 걱정한다. 이 대표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되느냐고.
세상은 무섭게 변한다. 오늘 같은 내일은 없다. 지도자가 한 발 삐끗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사법 리스크만 떼어놓으면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낙연처럼 껄끄러운 내부 경쟁자도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이 묻고 걱정한다. 이 대표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되느냐고.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 단일대오다. 그 완강한 구심력이 역설적으로 바깥세상의 변화와 혁신에 둔감하게 만든다. 좌파 이념에 뿌리를 둔 교조적 정책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주 4일제 도입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혹 떼려는 사람에게 혹을 더 붙이는 격이다. 주 52시간 틀 내의 근로시간 조정을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요즘 제조현장에 일손이 없어 일당 20만원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쓰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탈원전 이념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처리를 한사코 가로막았다. 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에 길을 터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넘쳐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존 원전 가동도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천지가 뒤바뀌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패러다임은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확충’으로 급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원전이든, 재생이든, 신재생이든 닥치는 대로 전력망을 늘리고 있다. 미국 전력 인프라에는 한국 기관투자가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달 초 뉴욕 출장길에 동행한 금융업계에 국내 전력 투자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다. 첫마디가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였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국내 전력 사정도 다급하고 빠듯한 판에 우리 돈으로 미국 발전소와 송배전망만 깔아주게 생겼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에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외교·안보전략의 퇴행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친일·반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북핵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고답적 평화 타령을 반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외유성 나들이’로 조롱했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북·러 밀착에 대해선 한 줄의 비판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이 모든 사태가 윤 정부 탓이라는 힐난만 있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내부 식구들만 타박하는 ‘방구석 여포’와 다를 바 없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이 왜 우리 정부 잘못인가. 본인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까지 두고 온갖 무리수를 뒀으면서도 왜 평화를 만들지 못했나. 기업 법인카드 받아 펑펑 쓰고 다닌 이화영 같은 인물은 왜 걸러내지 못했나.
2027년 차기 대선은 특히 중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 교체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28년 봄에는 중국 시진핑의 집권 3기가 끝나고 가을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29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일부는 영구집권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르지만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든 패권국가들의 각축전이 격화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견제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그들과 맞서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나. 2028년은 당초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대등해진다는 전망이 나온 해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그즈음이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늘 위기와 기회의 교차로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변화의 물결은 너무나 거셀 터여서 자칫하면 해방 이후 착실하게 쌓아 올린 ‘80년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한국처럼 많은 것을 일군 나라는 한두 세대에 걸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앞선 세대에 빚을 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 국가 지도자를 꿈꾼다면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거시적인 안목과 식견, 국제적 감각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라는 창은 좁고 편향적이다. 눈을 들어 바깥세상을 한 바퀴 둘러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