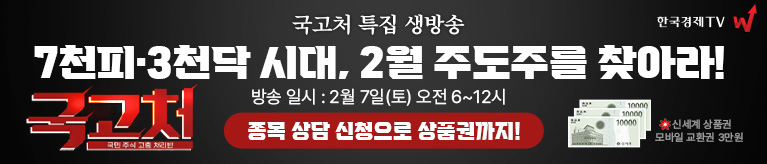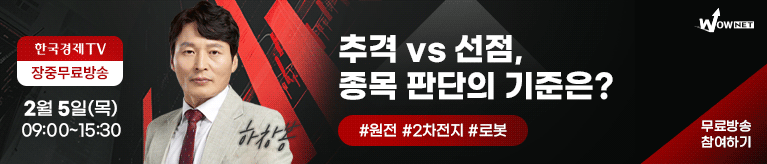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저의 소설이 냉소적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게 되니까요. 제 나름의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신작 소설집 《장미의 이름은 장미》(문학동네)를 최근 펴낸 은희경 작가(63)의 말이다. 서울 서교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문학”이라며 “이번 소설집에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편 《빛의 과거》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이 책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네 편의 중·단편을 담았다. 표제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가 오영수문학상을,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가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는 등 수록작이 문예지를 통해 먼저 발표된 뒤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이혼 후 홀로 어학연수를 떠난 마흔여섯 살의 수진이 어학원에서 세네갈 흑인 청년 마마두를 만난 이야기다. 짧은 영어지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통할 것 같았던 그들은 어느 순간 소원해진다. 은 작가는 “학교 안에서 학생 대 학생으로 만날 땐 괜찮았지만, 밖으로 나가 타인의 시선 속에 놓이자 수진의 흑인에 대한 편견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속 대사 “이름이란 무엇인가,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로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에서 따왔다. 마마두는 편견 없이 수진을 보지만, 수진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이 소설은 고독한 인간이 소통을 바라지만 선입견과 편견에 가로막힌 이야기다. 다만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말미에 느껴진다. ‘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글짓기 시간에 마마두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온 수진의 모습을 그린다. 한국으로 돌아온 수진은 마마두 고향의 풍경을 상상해본다. 마마두의 글처럼 문학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소설은 소통에 관해 얘기하지만 완전한 소통을 추구하진 않는다. 은 작가는 이를 ‘고독의 연대’라고 했다.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생기는 연대감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통하려고 하면 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고 다가가야죠.”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는 계약직 직원이던 승아가 뉴욕에 사는 소꿉친구 민영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충동적으로 뉴욕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인스타그램 밖 뉴욕은 기대와 달랐다. 민영 역시 언제든 ‘환영’한다던 인스타그램 속 말과 달리 정말 여행을 와버린 승아를 부담스러워한다.
소셜미디어는 요즘 작가가 열심히 들여다보는 세상이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이고, 동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하니까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봐요.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구나 등을 살펴보죠.”
현대 사회가 옛날처럼 작은 공동체가 아니어서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그는 말했다. 악(惡)이 소셜미디어에서 밈으로 소비되며 본질이 가려지는 것에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소설 쓰는 게 재미있다”는 그는 당분간 단편을 계속 쓸 계획이다. 다음달 《새의 선물》 100쇄 기념 개정판을 펴내고, 내년에는 다시 장편을 집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냈지만 그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