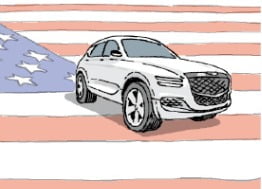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것은 1986년. ‘포니’로 국산 승용차의 꿈을 실현한 지 10년 만이었다. 당시 브랜드는 ‘뛰어난 포니’라는 뜻의 ‘포니 엑셀’이었다. TV 광고에서는 ‘싼 가격’을 앞세웠다. 교외에 사는 젊은 부부를 통해 ‘신차 한 대 값이면 엑셀 두 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첫해 16만8000대, 이듬해 26만3000대를 팔았다.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것은 1986년. ‘포니’로 국산 승용차의 꿈을 실현한 지 10년 만이었다. 당시 브랜드는 ‘뛰어난 포니’라는 뜻의 ‘포니 엑셀’이었다. TV 광고에서는 ‘싼 가격’을 앞세웠다. 교외에 사는 젊은 부부를 통해 ‘신차 한 대 값이면 엑셀 두 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첫해 16만8000대, 이듬해 26만3000대를 팔았다.그때만 해도 내세울 건 싼 가격밖에 없었다. 품질과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다. 이 때문에 ‘싸구려 차’라는 인식만 퍼졌다. ‘일회용 차’ ‘붙어 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라는 악평까지 들었다. 정비망이 따라주지 못하자 딜러도 줄어들었다. 결국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연간 판매량이 9만여 대로 추락했다.
극적인 반전은 1999년 하반기에 일어났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10년 기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판매 부진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정몽구 회장 취임과 함께 품질 최우선주의의 자신감에서 나온 정면승부 전략이었다.
2005년 앨라배마주에 첫 완성차 공장을 세운 것도 분기점이 됐다. 품질혁신과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2010년에는 ‘브랜드 재구매율 조사’ 3위에 올랐다. 2015년엔 누적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속도위반 딱지를 뗄 정도”(포천)의 급성장을 이뤘다.
최근 집계된 지난해 실적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혼다를 제치고 미국 내 판매 5위에 올랐다. 첫 수출 때 혼다 브랜드와 발음·로고가 비슷해 ‘혼다 짝퉁이냐’ 소리를 듣던 현대차가 보란 듯이 혼다를 추월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공급망을 잘 관리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 앞선 게 주효했다.
현대차가 처음 미국 땅을 질주하던 당시, 미주 한인들은 “100여 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첫발을 디딘 이래 가장 가슴 뭉클한 일”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을 전쟁 직후의 극빈국으로만 기억하던 미국인들도 자동차 수출국의 위용에 놀랐다.
미국 진출 35년 만에 이룬 현대차의 대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품질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으며 무한경쟁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점도 함께 새긴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