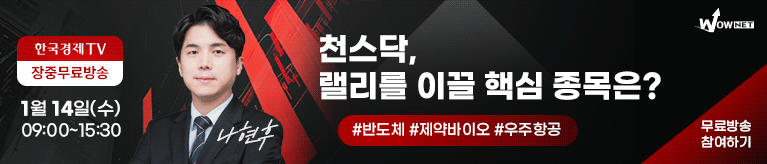코로나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교훈’을 찾는 나라로는 독일과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라고 해서 그간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일상화에 대응해 그간의 실패를 복기하고, 사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선 코로나 충격을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논의가 많다. 독일은 코로나 백신을 472만 회(지난 18일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접종했다. 그러나 100명당 접종 횟수는 5.63회로, 이스라엘(81.78회)과 미국(17.44회)을 크게 밑돈다. 지방분권 전통이 뿌리 깊고, 디지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이 기회에 독일 전역에서 호환되는 의료 분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백신 접종 여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자체 백신 개발 노력이 주목된다. 향후 코로나가 독감처럼 ‘토착화’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이이치산쿄, KM바이오로직스 등 일본 제약사들이 잇달아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에 나섰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격차가 크지만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는 독일과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과 크게 대비된다. 한국 사회는 지난 1년을 검찰개혁 같은 정파·진영 간 갈등에 매몰돼 허송했다.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백신 수송훈련’을 벌이거나, 주사기 생산업체를 치켜세우는 안쓰러운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될 것”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등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모두 공언(空言)이 됐다. ‘K방역’ 자화자찬도 자세히 뜯어보면 ‘퍼주기 논란’을 부른 재난지원금과 ‘+알파’식으로 복잡하기만 한 ‘고무줄 방역’밖에 안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