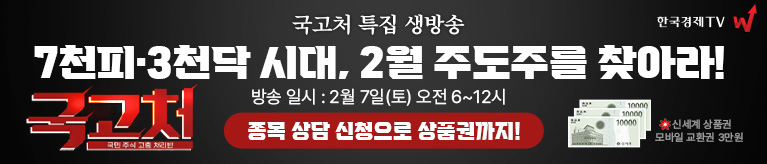요즘 은행권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은행 건전성을 따지는 주요 통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요즘 은행권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은행 건전성을 따지는 주요 통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은행들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3508개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했더니 4.4%(157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줄었다. 2019년에는 3307곳 가운데 210곳(6.3%)에서 부실징후가 포착됐다. 최하 등급으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는 D등급의 경우 지난해 91곳에서 올해는 60곳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결국 ‘착시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코로나19 유동성 지원 효과로 회생신청(법정관리) 기업이 줄었고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이라는 전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따져봤으니 지금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 해마다 상반기에 시행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하반기에야 이뤄졌다. 지난 3월은 코스피지수가 1500선 밑으로 무너져내리며 대기업에서조차 비명이 터져나왔던 시기였다.
신용위험평가뿐만 아니다. 은행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10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4%에 그쳤다.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0.12%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 원리금 상환까지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졌으니 연체율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총자본비율은 감독기준(8.0% 이상)의 두 배가 넘는 16.02%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바젤Ⅲ 최종안을 1년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한 여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통계를 믿지 못하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봤더니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금융지주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은행에 배당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원금은 둘째치더라도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볼 수 있게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이자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위기의 해법은 정확한 현실 파악에서 시작된다. 위기를 감추는 데 급급한 ‘깜깜이 통계’로는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려는 금융당국의 용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