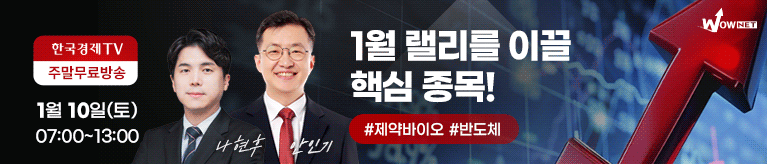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외부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지적받은 뒤 문제가 생기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도 중과실이 있다고 간주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정훈 삼정KPMG ACI(감사위원회지원센터) 상무는 22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 마켓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감사위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ACI는 기업 감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저널과 핸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기업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소수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커진 권한 만큼 의무가 늘어나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통 비상근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나 외부감사 등이 있을 때 주로 활동한다. 과거엔 교수나 사회저명인사들의 명예직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심 상무는 "정부가 감사위원회 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미국식 제도를 대거 도입했으나 국내 현실은 미국에 비해 열악하다"며 "미국의 대기업 감사위원은 연간 1000시간 정도를 업무에 쓰는데 국내 비상근 감사위원들은 회의 직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상무는 "몇 년 전 대기업 분식회계 사태로 관련 감사위원들이 대거 소송에 휘말리면서 다른 기업 사외이사 후보들이 '감사위원직은 수락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이 미약하다는 점도 감사위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다. 심 상무는 "대부분 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며 "국내 기업의 고용 현실상 외부인인 사외이사를 위한 조직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만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외부 컨설팅·회계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 차라리 실효성 있는 상근감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당 기업 감사위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정KPMG의 분석 결과 코스피200에 속한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위한 전담 조직이 있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상무는 "지난해엔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4곳에 그쳤으나 올해는 늘어날 수 있다"며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상무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원들이 감시활동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들이 내부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직무상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