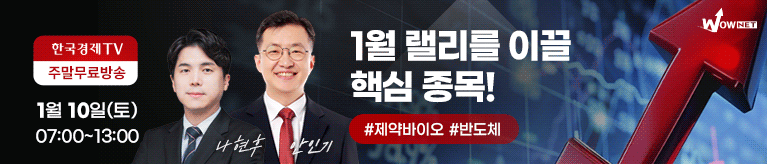우리말 역사에서 1933년은 꼭 기억해야 할 해이다. 그해 10월 29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비로소 우리말 정서법의 토대가 마련됐다. 당시 통일안을 발표할 때 외래어 표기법과 띄어쓰기는 본문에 함께 다뤄졌다. 표준어와 문장부호는 따로 부록으로 실렸다. 그뒤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나오면서 표준어는 독립 규범으로 떨어져 나왔다.
[함쑤]가 예전 표준발음…이젠 [함수]도 허용
문장부호는 지금도 한글맞춤법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표준발음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준발음법이 따로 독립 규범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로부터 50년도 더 흐른 1988년 와서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발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표기에 비해 발음은 훨씬 더 각양각색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가)“사람은 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나)“아는 문제였는데 마지막 ‘분수’ 계산에서 분모와 분자를 헷갈려서 틀렸다.” 두 문장에 쓰인 ‘분수’는 한글 형태도 같고, 한자도 ‘分數’로 똑같다. 하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안다. 가)에선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란 뜻이다. 나)는 수학에서 ‘몇 분의 몇’ 할 때의 그 분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문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구별하는 수단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발음’에 의한 것이다. 가)의 분수는 예사소리로 [분ː수], 즉 ‘분~수’라고 길게 읽는다. 나)의 분수는 [분쑤], 즉 짧게 된소리로 읽는 말이다. ‘분수를 지키다’라고 할 때의 ‘분수[분:수]’와 수학에서의 ‘분수[분쑤]’가 발음이 다른 것은 1957년 완간된 <조선말 큰사전>(한글학회)에서도 확인된다. 발음상의 차이가 그만큼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구별이 무뎌지게 됐다. 규범에서의 발음과 현실 언어에서의 발음이 다른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언중이 실제 쓰는 쪽으로 규범 바뀌는 추세
2017년 봄, 국립국어원 회의실에는 표준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사례 여러 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우리말의 경음화 현상과 관련해 복수발음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교과서([교과서] 대 [교꽈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말이다. ‘효과, 관건, 불법’ 등의 사례도 함께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예사소리가 표준발음인데 실제론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았다. ‘함수, 점수, 안간힘’ 같은 말은 어떨까? 이들은 반대로 된소리, 즉 [함쑤, 점쑤, 안깐힘]으로 발음하던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해야 할 [분쑤]를 예사소리 [분수]로 읽는 것도 이날 제시된 여러 사례 중 하나였다.
 회의에서는 언어 현실을 반영해 복수발음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데로 뜻이 모아졌다.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과서’의 발음은 [교과서/교꽈서]가 함께 표준발음으로 바뀌었다. [효과/효꽈] [관건/관껀] [불법/불?] 역시 복수발음이 허용됐다. [분쑤/분수]를 비롯해 [함쑤/함수, 점쑤/점수, 안깐힘/안간힘]도 마찬가지다. 복수 표준 발음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다. 표준발음의 원칙은 표준발음법 총칙 제1항에 정해져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르는 것이 표준발음법을 운용하는 기본정신이다.
회의에서는 언어 현실을 반영해 복수발음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데로 뜻이 모아졌다.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과서’의 발음은 [교과서/교꽈서]가 함께 표준발음으로 바뀌었다. [효과/효꽈] [관건/관껀] [불법/불?] 역시 복수발음이 허용됐다. [분쑤/분수]를 비롯해 [함쑤/함수, 점쑤/점수, 안깐힘/안간힘]도 마찬가지다. 복수 표준 발음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다. 표준발음의 원칙은 표준발음법 총칙 제1항에 정해져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르는 것이 표준발음법을 운용하는 기본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