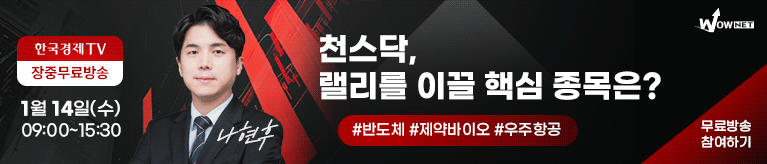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고민은 한 가지다. 도대체 바이오 업체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일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생물공학 박사를 받고 현재 사모펀드 LSK인베스트먼트에서 대표를 지내고 있는 김명기 씨가 최근 출간한 '바이오 인더스트리 밸류에이션(출판사 바이오스펙테이터)'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김 대표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기업 연구소의 신약개발 연구소에서 약 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이후 20년 가량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성공한 신약이 나오면 실험실의 연구자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연구 논문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 되기까지는 20~30년이 걸린다"며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논문은 유명 과학저널에 실리더라도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통과시키고, 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를 계산하고, 규제기관과 협의해 승인을 받고, 안정적으로 약을 생산해 환자의 침대 옆까지 보내는 모든 일의 뒤에 투자가 있다"는 게 저자의 논지다. 그는 이러한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코디네이팅하는 '역량 있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바이오 신약개발의 여러 면모인 산업 측면, 보건정책의 측면, 투자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기를 꿈꾸는 투자자가 많지만, 성공 확률은 대단히 낮다. 이러한 초기 과학 연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자 나름의 설명을 제공한다.
또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등 초기 단계를 넘은 신약개발의 경우 투자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별도의 꼭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등을 나름대로 전개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김 대표는 "과학으로서의 연구, 통찰과 리더십이 핵심인 개발, 수익을 거둬 들여야 하는 시장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 4만5000원.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