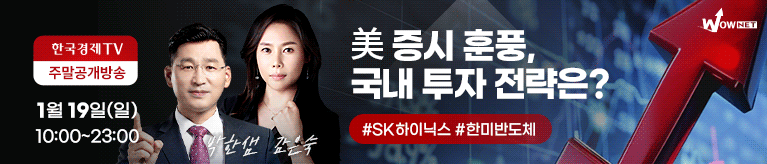버락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 완성에 상당히 열심이었다.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시작됐다.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였다. 그런데 국제 통상·경제 무대에 큰 변수가 생겼다. 중국의 약진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덩치가 급성장한 중국은 아세안+3국(한·중·일)을 기반으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 FTA로 블록경제까지 주도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 완성에 상당히 열심이었다.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시작됐다.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였다. 그런데 국제 통상·경제 무대에 큰 변수가 생겼다. 중국의 약진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덩치가 급성장한 중국은 아세안+3국(한·중·일)을 기반으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 FTA로 블록경제까지 주도하기 시작했다.세계 인구 절반, 세계 총생산 3분의 1을 블록화하는 RCEP에 미국은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중국 대외관계의 간판처럼 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미국을 더욱 긴장시킬 만했다.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제안으로 가시화한 일대일로는 150년을 내다본다는 소위 ‘중국몽’의 상징이다. 국제적 논란 속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내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공략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이야말로 ‘자본의 힘’을 제대로 아는 것 같다.
RCEP의 대항마로서 TPP를 키워왔으면서도 정작 이를 무력화한 게 미국이었던 것은 아이러니다. 2016년 선거캠페인 때부터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과 함께 TPP를 탈퇴해버렸다. 전임자가 공들여온 중국 견제 경제블록의 힘을 스스로 빼버린 셈이다.
하지만 팽창하는 중국, 더구나 경제성장 이상의 패권적 행보에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대립에 이어 기술 전쟁, 군사적 대치까지 불사하는 일련의 대결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단기적 견제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누르기’에는 공화·민주 구별도 없다.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가 그렇게 나왔다. 언론에 등장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실체도 명확지는 않다. 하지만 산업·경제블록으로, 국력을 총동원하는 반중(反中)의 국제적 가치연대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별 기업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향해 ‘EPN 동참’ 러브콜을 보내는 게 한편으로 부담도 된다. EPN은 어떻게든 일대일로를 꺾으려 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블록경제가 강화되고, 산업 밸류체인에도 진영논리가 강하게 끼어드는 게 한국 기업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