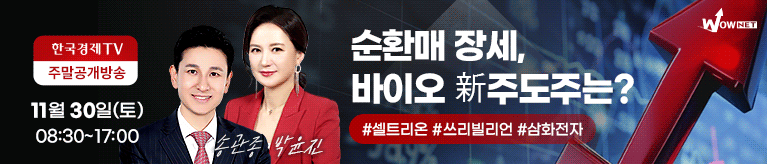모바일 앱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결국 다음달 멈춰 서게 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5개월 만이다.
모바일 앱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결국 다음달 멈춰 서게 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5개월 만이다.타다는 조금 과장하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소비자는 없다’는 그런 서비스였다. 소비자들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나오자 즉각 환호했다. 170만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비싸지만 넓고 쾌적하고 깨끗한 데다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면서 ‘모빌리티 혁신’이라고 박수쳤다.
이런 서비스를 멈춰 세운 것은 국회였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지속된 반발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를 패배자 만든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타다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봐야 손실만 불어나기 때문이다. 타다 운전기사 1만200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할 수 있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그래도 소비자들은 타다의 영업을 막기 위한 ‘금지법’이라는 것을 잘 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타다 금지법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변하는 세상을 외면한 채 신사업을 막아 택시를 구제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타다 운영기업인 VCNC의 모기업 경영자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쏘카 이재웅 대표의 쓴소리는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줄곧 논란을 빚어온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정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갈등 조정의 책무를 맡고 있지만 타다 대립을 조정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지켜만 봤다. 그랬던 두 당사자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타다 금지법 처리에 조용히 손발을 맞췄다.
'미래' 대신 '과거' 택한 국회
한쪽에서는 타다의 편법성을 비판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때만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시행령의 틈새를 파고든 꼼수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혁신은 숨 막히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봉쇄하기만 해서는 누구도 혁신에 뛰어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타다 금지법은 눈앞의 타다 서비스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 마인드까지 잘라 버린 것일 수 있다. 만약 ‘과거’와 ‘현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도전을 꺾어 버린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미국의 우버, 베트남·태국의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었다면 타다 갈등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갈등 탓에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이 좌절해서는 안 된다.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