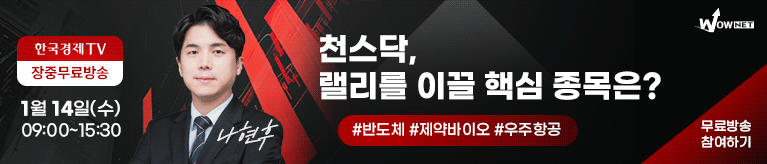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銀産) 분리’를 일부 완화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핀테크 혁명’에 필수로 꼽혀 왔다. 작년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표결 전 여야가 통과에 합의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좌파성향 시민단체와 보조를 맞춘 몇몇 의원의 반대에 법안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배제하는 등 통제장치가 충분했는데도 시대착오적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은행법과 무관한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박용진)이 본회의 반대 표결을 주도한 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논리에 휘둘리는 국회의 민망한 수준을 잘 보여준다.
‘좌파 눈치보기’는 국정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집단반발을 부른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도 그런 사례다. 대법원 판결이 났고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는데도 배상이 결정된 것은 “정부 기관이 시민단체화됐다”는 탄식마저 부르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금감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몰아붙인 지 2년이 되도록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좌파 보조 맞추기’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편향 집단들의 생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거대 노조들의 ‘철밥통 투쟁’이 잘 보여준다. 글로벌 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감산이 불가피한데도 기아자동차 노조는 ‘수당이 부족하다’며 사측에 잔업 실시를 강요하고 있다. ‘키코 배상 결정’이 금감원의 권위 추락을 자초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감성 논리’에 포획된 국회와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국정 혼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