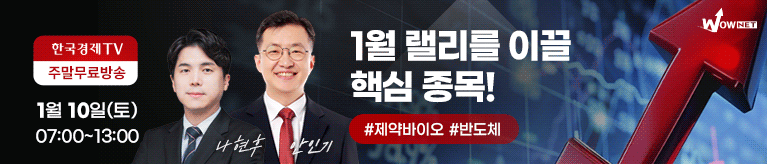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대책에 불과한 데다 일부는 업계 현실과도 맞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라임운용이 1조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날려버린 사실을 고백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종합검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한 투자자는 “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공모펀드 통제장치 해제, 펀드 운용인력 요건 완화,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등 금융당국이 지난 수년간 시행했던 일련의 정책이 이번 라임운용 사기에 고스란히 악용됐다”며 “그 결과 1조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이 나타났지만 책임있는 금융 수장들이 이에 대한 반성과 유감의 뜻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재발 방지책 가운데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가 사모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PBS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모운용사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유치해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PBS에 대한 운용사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감시 책임만 떠넘긴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량 미달의 사모운용사가 난립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전임 금융위원장이 사모운용사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면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이런 사고가 터질 것을 예감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급격한 정책 기조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라임사태)가 일어났다고 다시 법과 규제를 강화하면 이제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융 질서는 더욱 후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감시·관리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