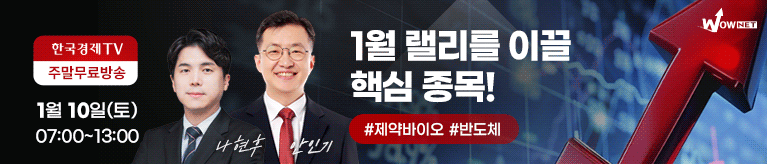올해로 창립 118년을 맞은 핀란드 최대 금융회사 OP파이낸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5년 포횰라 보험사를 인수해 보험업에도 진출했다. 그런데 급격한 디지털 변화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했다. OP파이낸셜은 모바일 뱅킹, 가상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이에 맞춰 변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야 했다. 2016년 이 회사의 이사회는 20억유로(약 2조6114억원)를 투자해 디지털 서비스를 내놓는 방법을 고민했다.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양한 은행·보험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내놓은 답은 전혀 달랐다. 병원 다섯 곳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헬싱키, 탐페레 등 5개 도시에 포횰라 병원이 문을 열었다. OP파이낸셜은 디지털 서비스를 병원에 접목해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 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의료법인 포횰라테르베우스를 이끌었던 사물리 사르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쉴 곳을, 차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동을 원해요. 보험이 아니라 건강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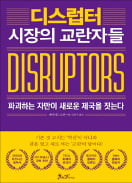 《디스럽터》는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새로운 판을 짠 기업과 전략을 소개한다. 저자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잡지 ‘와이어드’ 영국판의 창간 편집장을 지낸 기술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로완이다.
《디스럽터》는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새로운 판을 짠 기업과 전략을 소개한다. 저자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잡지 ‘와이어드’ 영국판의 창간 편집장을 지낸 기술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로완이다.저자는 “많은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혁신 연극’일 뿐”이라며 “급진적 변화에 대비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혁신 연극에만 도취해 있기엔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화기는 5000만 사용자에 도달하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아이팟은 4년, 포켓몬고는 19일이 걸렸다”고 지적한다.
책 제목인 ‘디스럽터’는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 교란시키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저자에 따르면 시장의 파괴자이자 교란자인 디스럽터들은 보여주기식 연극은 하지 않는다. 기존의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엎고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문제를 움켜쥐고 고민하지 않는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받아들인다. 미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고집을 부린다.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게 달렸다.”
미국 피자업체 도미노피자를 2010년 인수한 패트릭 도일 최고경영자(CEO)도 디스럽터에 해당한다. 도일이 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도미노피자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도일은 이를 숨기지 않았다. TV광고에 직접 등장해 ‘내가 먹었던 최악의 피자’ ‘케첩 맛이 나는 소스’ 등 고객의 가혹한 비판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고객을 사업의 중심에 둘 것을 선언했다. 직원들에겐 ‘나쁜 아이디어 책’이라고 불리는 노트도 나눠줬다. 어설프더라도 피자 맛 또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노트에 쓰도록 했다.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겐 보상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후 도미노피자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2010년 9달러 수준이던 주가는 10년 만에 30배가 넘는 279달러까지 뛰었다.
냄비나 프라이팬을 파는 회사도 얼마든지 파괴적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미국 요리기구 회사 메이어인더스트리는 2015년 더 이상 냄비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가이드 쿠킹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조리법, 조리기기 사용법 등을 담은 요리 앱을 개발한 것이다. 이 앱은 단순히 조리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들은 앱과 냄비를 블루투스로 연결했다. 냄비의 철판 내부엔 열 센서가 있어 앱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온도로 요리를 한다. 냄비를 생산하던 회사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저자는 기업이 디스럽터의 파괴적 사고방식과 전략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직원들에게 준 핸드북 문구 한 줄이 잘 설명해 준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죽일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