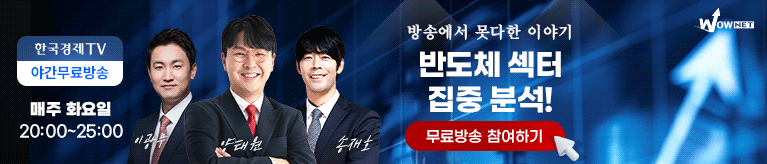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스타트업 앞세워 모빌리티 사업 진출 저울
국내 정보서비스 IT 기업의 양대 산맥은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이미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한창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끝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정보서비스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미래라는 것이 결국 '지능화 된 이동'이라는 점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배제한 채 미래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글이 그렇고 애플은 나아가 이동 수단 제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우버와 그랩, 디디추싱과 같은 모빌리티 호출 연결 기업도 결국은 종합 이동 서비스로 나아가되 필요할 경우 이동 수단의 위탁 생산마저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
반면 전통적으로 이동 수단을 만들어왔던 제조사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 또한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직접 만든 제조물을 판매해 수익을 추구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뿐 아니라 이용 단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해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아닐 수 없다. GM이 미국 내 우버의 경쟁사 리프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것도, 현대차가 우버 지분을 취득한 것도 같은 목적이다. 이외 토요타와 포드, BMW, 벤츠 또한 예외가 아니고 폭스바겐은 아예 자체적으로 우버의 경쟁사로 승차 공유 기업 '모이아(MOIA)'를 만들어 서비스에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민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 이동 서비스 사업에 종사해 온 교통사업자 또한 자동차회사의 제조물을 사주는 '주요 고객'이어서다. 여러 단어로 포장됐지만 현대차를 포함한 기존 자동차 제조사가 한결같이 내건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전환'은 한 마디로 '대중교통 사업'이다. 현대차가 버스운송업을 하고 택시를 운영하며 초단기 렌탈(카셰어링)까지 직접 만든 이동 수단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켜주는 사업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기존 교통사업자와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존 교통사업자도 자동차회사의 고객
-주행데이터 확보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필요
그런데 교통사업자 뿐 아니라 자동차회사 입장에선 개인 또는 렌탈사업자 등도 모두 고객이다. 카풀에 나서는 자가용 이용자도 고객이고 택시 사업자도 제품을 사주는 그룹이다. 또한 이동 수단의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택시 호출 중개업도 고마운 존재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직접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룹의 청사진은 스마트 모빌리티, 즉 교통사업을 지향하지만 이를 위해 내딛어야 할 길은 한 마디로 가시밭이다. 택시운송업에 참여하면 기존 택시사업자가 반발하고 버스운송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과거 렌탈사업 참여에 나섰다가 전국 렌탈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친 경험이 있고, 카풀 기업 럭시에 투자했다가 택시 반발로 지분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넘겨주기도 했다. 교통과 관련된 그 어떤 사업을 검토해도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교통사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하다.
 |
하지만 미래를 위한 사업 전환을 선언한 마당에 현대차에게 교통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우회 진출이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할 기업을 찾아내 경쟁을 시키되 서서히 교통사업에 발을 뻗는 방식이다. 최근 네이버 CTO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현대차가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사실이 주목받는 이유다. 모빌리티 사업을 주력으로 삼으려는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형 정보서비스 기업 출신이고, 이들 또한 결국 현재 시장에서 앞서가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에 비춰 교통사업 우회 진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해당 스타트업이 택시, 버스,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장 장악력을 높여갈수록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의 교통사업 진출은 우회적으로 완성된다는 작전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통사업자들의 직접적인 반발 또한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카풀-택시'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흔히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은 한 국가에서 하나만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모가 큰 곳은 2~3곳이 경쟁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작은 시장은 최후에 살아남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는 게 정설처럼 통한다. 하지만 생존하려면 국내와 해외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된다. 카카오 모빌리티 앱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지만 우버앱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서 통용되는 게 무기다. 따라서 이미 우버에 지분 투자를 해둔 현대차로선 국내 과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항마가 될 만한 스타트업, 특히 네이버 출신의 창업자를 선택함으로써 국내에서 스마트(?)하게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는 그림이다.
물론 현대차의 청사진처럼 상황이 전개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회 경로를 선택하면 기존 교통사업자의 반발은 피해갈 수 있다. 어차피 새로운 이동 방식이 활발히 전개될수록 전통적 개념의 교통사업자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선택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었다는 의미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 [하이빔]SUV로 중국 지배하려는 폭스바겐
▶ [하이빔]휘발유는 되고 LPG는 안 되는 셀프 충전
▶ [하이빔]BMW 3시리즈에 주어진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