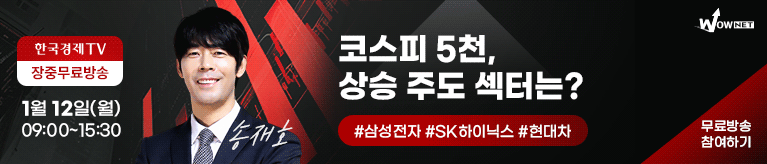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공공 충전소=주차장' 여기는 문화 사라져야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비워두는 배려 시급
최근 제주도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전기차가 활성화 된 도시인 만큼 EV를 대여했다. 전국에서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이기에 충전 걱정도 별로 없어 택한 이동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 배터리 잔량이 20㎞ 정도를 남기면서 급속 충전이 필요하게 됐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1기의 급속 충전소를 찾았으나 그곳엔 충전한 지 40분이나 경과된 다른 전기차가 탑승자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결국 30분 정도를 더 기다린 뒤에애 차주가 나타났고, 이후 충전이 가능했다.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의 80%를 채운 이후 완속 모드로 전환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속'이란 의미가 사라진다. 30㎾h 미만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20~30분 정도의 급속 충전이 이뤄지면 충분히 제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충전을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충전소는 어떨까?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가 주차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차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걸면 충전소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때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식의 얘기가 들려왔다.
전기차 충전소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설치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견인이 불가하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부정 주차 같이 과태료 대상도 아니어서 아직 운전자들의 매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쉐보레 볼트 EV를 시작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연이어 출시되는 등 자동차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역시 확대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배려가 요구된다. 한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량이 20%였을 때 20분을 충전하고 20분을 산책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충전소 에티켓을 강조하기도 한다.
업계에선 전기차 충전소를 화장실 같은 공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급한 용무를 보고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신속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 말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충전 공간을 사적(?)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기주의나 다름 없으니 말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람보르기니가 한국서 전기차 사업을?
▶ [하이빔]그 많던 중형 세단은 어디로 갔을까
▶ BMW코리아, 540i로 5시리즈 영토 넓힌다
▶ DS7 크로스백, 프리미엄 입고 내년 한국 도착
최근 제주도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전기차가 활성화 된 도시인 만큼 EV를 대여했다. 전국에서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이기에 충전 걱정도 별로 없어 택한 이동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 배터리 잔량이 20㎞ 정도를 남기면서 급속 충전이 필요하게 됐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1기의 급속 충전소를 찾았으나 그곳엔 충전한 지 40분이나 경과된 다른 전기차가 탑승자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결국 30분 정도를 더 기다린 뒤에애 차주가 나타났고, 이후 충전이 가능했다.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의 80%를 채운 이후 완속 모드로 전환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속'이란 의미가 사라진다. 30㎾h 미만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20~30분 정도의 급속 충전이 이뤄지면 충분히 제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충전을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충전소는 어떨까?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가 주차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차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걸면 충전소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때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식의 얘기가 들려왔다.
전기차 충전소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설치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견인이 불가하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부정 주차 같이 과태료 대상도 아니어서 아직 운전자들의 매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쉐보레 볼트 EV를 시작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연이어 출시되는 등 자동차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역시 확대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배려가 요구된다. 한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량이 20%였을 때 20분을 충전하고 20분을 산책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충전소 에티켓을 강조하기도 한다.
업계에선 전기차 충전소를 화장실 같은 공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급한 용무를 보고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신속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 말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충전 공간을 사적(?)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기주의나 다름 없으니 말이다.
 |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람보르기니가 한국서 전기차 사업을?
▶ [하이빔]그 많던 중형 세단은 어디로 갔을까
▶ BMW코리아, 540i로 5시리즈 영토 넓힌다
▶ DS7 크로스백, 프리미엄 입고 내년 한국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