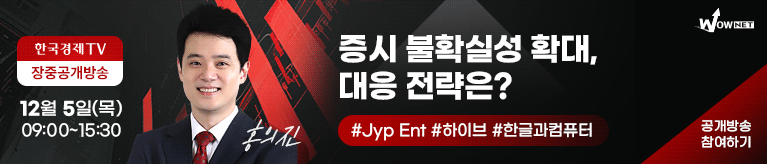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가 불량 신차를 다른 차로 교환받거나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그런데 여전히 '강제성'은 배제돼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눈길이 적지 않다.
 |
공정위가 이번에 개정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바뀐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불량이 발생하는 시점을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 인도일 기준으로 바꿨다. 신차를 받은 이후 12개월 사이에 동일 부위 중대결함이 3회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 결함도 3번 수리하고 4번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급이 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신차 구입 후 12개월 동안 일반 결함으로 30일을 초과해 수리를 받으면 교환이나 환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정위는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여러 사업자들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만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 결함 횟수를 줄이고, 기준 해결 적용 시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회사와 소비자 간 갈등의 씨앗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기업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엔진이 멈추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원인을 찾아 해결했는데, 또 다시 멈춘 뒤 살펴보니 다른 원인이 발견될 때 이를 동일 부위 같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다. 또한 문제 발생 원인을 운전자의 관리 책임으로 떠넘길 때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난 7월 국회에 강제성을 넣은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자동차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 교환 및 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면 소비자 피해액의 두 배를 배상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도록 말이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교환 및 환불에 강제성을 넣자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른바 불량 신차가 아닌 불량 소비자 때문이다. 일부러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 고장을 조작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소비자 과실을 무조건 제조사로 떠넘기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반대 논리다. 또한 이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교환 및 환불 조건이 제시된 만큼 새로운 기구 설치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점도 논란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강제성'이 결여된 만큼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비자 이익 쪽으로 반걸음 옮겼으니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