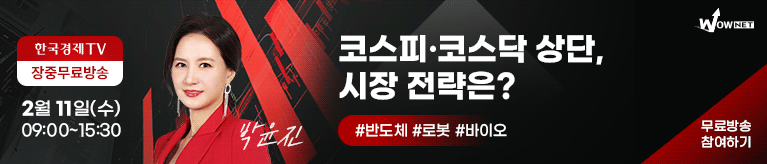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다 두 차례 적발된 숙박업소는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번은 봐주는 것이냐”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지만 숙박업체들은 “과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몰래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나온 조치다.

다만 공중위생업소 종류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다르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반면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삼진아웃제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는다. 세탁소는 4차례 위반해야 영업장이 폐쇄된다.
◆“숙박업체 ‘원아웃’ 처벌해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몰래카메라 설치가 최초 적발됐을 땐 바로 영업장이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는 것은 범법을 저지른 숙박업체들을 그냥 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여성운동 시민단체인 불꽃페미액션 서윤 활동가는 “몰래카메라 사용이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시민들의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한 처사”라며 “한 번 적발되면 바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 서울시가 지난달 23~29일 서울시민 1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에 달했다. 특히 숙박업소(43%)가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장소였다. 공중화장실(36%), 수영장 및 목욕탕(9%), 지하철(7.6%) 등도 뒤를 이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도 67%에 달했다. 서울시민 세 명 중 두 명은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숙박업소에선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는 민원으로 손님과 업주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52)는 “지난주 한 손님이 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구멍이 있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며 “못이 들어간 구멍이라고 조명을 비춰주고 나서야 손님이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달에 한두번씩은 몰래카메라 설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게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다.
◆“목욕탕보다 규제 지나쳐”
숙박업주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숙박업소와 다른 공중위생업소 간 제재 수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숙박업소 점주는 “몰래카메라로 전신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같은데 목욕탕은 삼진 아웃이고, 우리는 두 번 적발로 아웃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목욕탕은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지만, 숙박업소는 3개월간 문을 닫는다”며 “90일이나 영업을 정지하는 건 사실상 장사를 접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불법촬영 점검기기 875개를 마련해 각 자치구에 배부했다. 올 하반기부터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점검기기 대여,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만큼 숙박업체 업주들도 수시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몰래카메라를 누가 설치했는지 등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과 투숙객간 다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