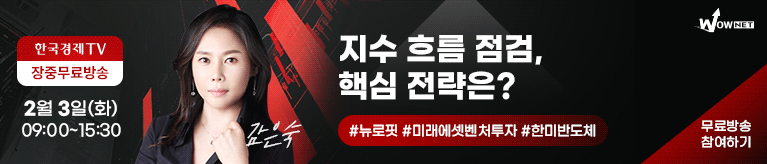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양가상한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종합세트’를 내놨다. 이후 집값이 2년여간 줄곧 안정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꿈틀할 조짐을 보이자 기선 제압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양가상한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종합세트’를 내놨다. 이후 집값이 2년여간 줄곧 안정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꿈틀할 조짐을 보이자 기선 제압 의사를 밝힌 것이다.분양가상한제는 사업시행자(조합 포함)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에 정부가 규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등을 보태서 분양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증·승인해주는 제도다.
1989년 분양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됐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자취를 감췄다가 2000년대 초반 집값 폭등으로 2007년 4월 ‘분양가상한제’로 부활하면서 민간택지 아파트로 적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도입 7년 만인 2014년 말 주택법에 흔적만 남겨놓고 사실상 폐지됐다. 적용 요건을 강화해서 활용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해묵은 실효성 논란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부활을 예고하자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주택업계 등 반대 측은 집값 안정 효과가 신통찮다고 지적한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곧바로 집값을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리기 때문이다. 시행자와 건설사의 이익 감소로 아파트 신규 공급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 찬성 측은 분양가 하락으로 기존 집값도 안정된다고 말한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안정세를 보였고, 2014년 상한제 폐지 이후 다시 급등한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도 통계로 증명되지 않은 허구라고 반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2007년 이후 2년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상한제 이전보다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지루하고 해묵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논란과 상관없이 정부는 오히려 주택시장 규제를 줄여가야 할 때다. 인위적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값 안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수요자 모두에 해당한다. 그래야 주택시장을 차분하게 볼 수 있다. 다음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국지적 집값 동향’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 집값이 좀 움직인다고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카드를 던지는 것은 무리한 대응이다.
이젠 주택규제 줄여나가야
국내 주택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극심한 수급불균형 상태였다. 이런 환경에서 주택공급자와 투기자본의 전횡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잉규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의 절대부족 상태가 해소되면서 완전경쟁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집값이 무조건 하향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리한 집값 규제에 신경쓰기보다 불공정하고 후진적인 부동산세제 정비에 공을 들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는 주거복지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 주택시장도 가격과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업계 글로벌 경쟁력도 길러지고 주택시장 선진화의 기틀이 잡힐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러 부활시키지 않아도 된다.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