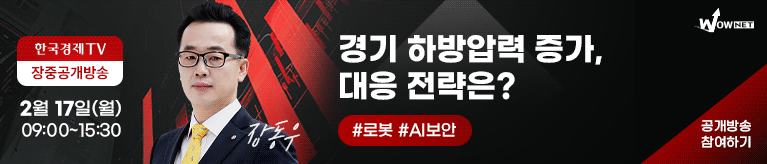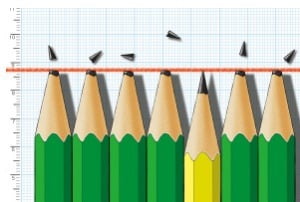 미국의 힘을 논할 때 ‘다원성의 사회’를 많이 거론한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민 국가로 시작해 다인종·다민족·다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낸 것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흑백·빈부·종교의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고 통합과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킨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힘을 논할 때 ‘다원성의 사회’를 많이 거론한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민 국가로 시작해 다인종·다민족·다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낸 것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흑백·빈부·종교의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고 통합과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킨 나라가 미국이다.갈등과 분쟁은 다원화·다양성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그만큼 균형도, 공존도 쉽지는 않다. 미국을 두고도 한편으로는 ‘용광로 사회(melting pot)’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샐러드 볼(salad bowl: 여러 가지 야채를 담는 그릇)’ 또는 ‘모자이크 사회(mosaic society)’라며 달리 평가한다. 어떻든 미국은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며 한층 다원화된 사회로 이행해왔다. 내전도 치렀지만, 결국은 타협과 양보 정신의 힘일 수 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기둥에 기반한 유럽도 근대 이후에는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을 비교적 잘 수용해왔다. 중세 봉건제도 경험에서 유럽식 다원주의의 기원을 보는 시각도 있다. ‘헤테로(이질)문화’의 수용으로 내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며 공존하는 게 ‘호모(동질)문화’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집단적 경험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교역에 기반한 해양 도시들이 고립된 농경지대보다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까지 향유한 것은 필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무엇보다 문화와 종족에서 ‘순수’ ‘고유’ ‘단일’과 같은 표현을 즐겨 써왔다. 한 시절 전 개념으로 밀려나고 있는 ‘민족’에 여전히 매달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주자학과 한자 문화, 서울 중심 중앙집권체제의 조선조 500여 년도 ‘상대적 가치’는 배제된 역사였다. 학문에도, 관료 행정체제에도, 일상의 생활사에도 다양성과 이질 문화는 스며들 틈이 없었다.
지금도 나라가 극단의 대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절제와 타협도, 중립지대도 안 보인다. 권력집단이 바뀌자 문화예술계까지 판이 바뀐다. 공정 구호가 넘치는 경제도 예외지대는 아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해 “평등을 빌미로 획일화된 사회를 낳는 무서운 정책”이라고 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의 한탄이 평준화 문제로만 들리지 않는다. 다양성이 없는 일차원적 사회, 명백한 퇴행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문화도 활력을 잃어 자칫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