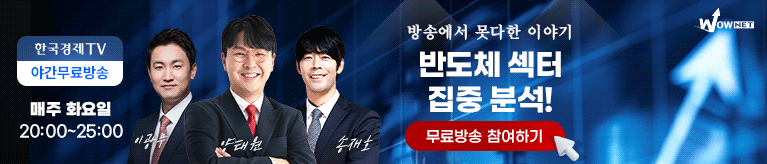스타육성 시스템만 갖춘 YG엔터
거대한 몸집 지탱할 시스템은 미비
[ 김희경 기자 ]

한류가 시작된 지 20여 년.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다. 방탄소년단, 봉준호 감독 등이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제 세계 많은 사람이 K팝을 즐기고 K드라마·K무비를 본다. 한류의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기에 생각지 못한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곪아버린 채.
 올해 상반기 내내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처음엔 ‘버닝썬’이란 클럽 문제였다. 여기서부터 연예인들의 마약, 성매매 의혹이 줄을 이었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건에 대중은 충격을 받았다. 더 큰 충격이 이어졌다. 이 사건들이 대형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얽히고설켜 있었다. 급기야 지난 14일 YG를 이끌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처음엔 ‘버닝썬’이란 클럽 문제였다. 여기서부터 연예인들의 마약, 성매매 의혹이 줄을 이었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건에 대중은 충격을 받았다. 더 큰 충격이 이어졌다. 이 사건들이 대형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얽히고설켜 있었다. 급기야 지난 14일 YG를 이끌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이 모든 치부를 한 회사의 이야기로 한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YG는 한류를 견고하게 지탱해 온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다. 대중은 화려하게만 보였던 문화권력의 허상과 마주하며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또 다른 어딘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품게 됐다. 이는 국내에만 국한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해외에서도 많은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힘겹게 쌓아올린 한류의 앞날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하나의 구멍, 스쳐가는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YG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빅3’가 설립된 시기는 한류가 태동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SM엔터테인먼트가 1995년, JYP엔터테인먼트가 1996년, YG가 1998년 세워졌다. H.O.T부터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K팝 자체가 3사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처음엔 국내에서 ‘팬덤’이란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낸 정도인가 싶었다. 그러다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지역으로 진출하더니, 마침내 미국 유럽 시장으로 뻗어갔다.
많은 전문가는 이들의 성장·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바빴다. 그들이 꼽은 주요 비결은 ‘시스템’이었다. 이들 회사는 중학생 시절 연습생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잘 다듬어진 아이돌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는 ‘육성의 시스템’일 뿐이었다. 여기에도 약간의 환상이 있었는지 모른다. 양현석, 이수만, 박진영이라고 하는 3사 수장의 재기에 의존해 성장한 측면이 강했다.
아이돌로 키우고 난 뒤 필요한 ‘관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거대해진 몸을 제대로 가누고 더 큰 길로 안내하는 방법엔 무관심했다. ‘관리’를 가장한 ‘은폐’만이 있었던 것 같다. 양현석은 지난 20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12종의 약물을 검사할 수 있는 마약 키트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했다는 얘기다. 양현석은 “예방 차원”이라고 했지만, 마약 진단을 곧 관리로 여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결국 기획사도, 스타도 몸만 성큼 자란 채 방향을 잃었던 게 아닐까. 회사 밖에서도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한류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만 볼 뿐, 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살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화 콘텐츠는 대표적인 ‘경험재’다. 경험하기 전엔 그 가치를 알 수 없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K팝, 나아가 한류 전체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곪아 터진 부위는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 모든 걸 차단할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해야 할 때다.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