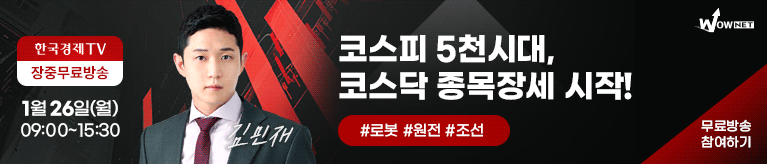수천 개 도자 픽셀틀 활용
한국 단색화 새로운 실험
아트파크갤러리에서 전시
[ 김경갑 기자 ]

도자 픽셀 하나하나가 가슴을 휑하게 꿰뚫는다. 거대한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미술로 보였다. 이제 ‘그림’이라는 말의 정의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림이란 화가가 붓을 들어 칠하는 게 아니라 ‘흙과 불로 응축한 도자 조각에 적힌 색의 음표들을 연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탄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 같다.
20일 서울 삼청로 아트파크갤러리에서 개막한 미술가 이흥복 씨(59)의 개인전은 흙과 불, 색채에 대한 40여 년의 짝사랑을 화면에 자유롭게 풀어내 이 시대의 현대미술을 새롭게 모색한 작업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빛깔을 입힌 수천 개의 직사각형 도자픽셀을 화면에 수놓은 최근작 12점을 걸었다. 선조의 숨결이 묻어 있는 고매한 도자예술을 현대적 미감으로 변주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영남대 미대를 졸업한 이씨는 젊은 시절 백자 항아리를 재현하는 도예가였다. 1993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프랫대학원에 유학한 그는 당시 백남준, 강익중과 교류하며 도자를 회화로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작업 방식을 바꿨다. 세계 화단에도 ‘그리기’보다 오브제를 가미한 입체 회화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었다. 힘이 들더라도 도자를 구워서 벽에 거는 작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2007년 귀국한 그는 경남 거창 산골에 작업실과 가마터를 마련하고 도자회화를 본격 시도했다. 흙의 물성 탐구와 흙 작업에 몰두하며 조선시대 화공(畵工)과 도공(陶工)의 역할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렸다. 강진과 밀양 등에서 출토한 고령토의 부드러운 입자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먹의 스밈과 배어듦을 맘껏 표현했고, 12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내는 안료로 특유의 질감을 살려냈다. 때로는 흙조각을 잇대어 형상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작은 정방형 도자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한 작품을 발표해 조형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작품 제목도 ‘삶에 대한 기하학적 명상’ ‘나는 수풀에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등 시적으로 붙여 현대 주거생활에 어울리는 ‘도자 회화’란 점을 강조했다. 전통적 도자 예술을 현대미술 영역으로 끌어들인 그의 작품은 이제 한국 단색화의 새로운 브랜드가 됐다.
작가는 “산다는 것은 이런저런 일상의 파편들이 모여 어떤 강한 색채의 덩어리로 폭발하면 서서히 빛으로 옅어져 또 다른 색깔로 바뀌는 순환의 어쩔 수 없는 고리”라고 했다. 실제로 백자도판을 픽셀 삼아 구축한 작품들은 전시 공간과 어우러지며 불교 윤회사상의 형태로 다가온다. 기하학적 단위 구조를 반복적으로 열거하고 집적해서인지 시간을 겹겹이 쌓아올린 삶에 비유되기도 한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과 영혼을 기하학적 색채 추상화의 세계로 끌어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흙을 빚는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거창의 산속 작업이 색채에 대한 자연스러운 깨달음이 됐죠.”
작가는 전시 작품을 가리키며 콧노래를 불렀다. “흙으로 와서 빛으로 스며든 삶이여, 원색물결로 꽃피우다 지리라. 한 줄기 빛에서 서서히 변화하는 붉고, 노랗고, 파란 색의 향원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