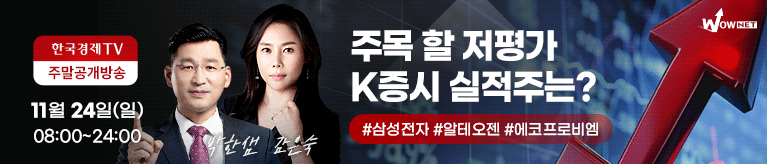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 박영태 기자 ]
 ‘담대한 도전이냐, 사기냐.’ 지난 16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중장기 회사 비전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향후 10년간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셀트리온 ‘비전 2030’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였다. 한쪽에서는 “(서 회장이) 지금껏 회사를 키워온 걸 보면 믿음이 간다. 진정한 기업가다”고 추켜세웠다. 다른 쪽에서는 “매출 1조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그런 거액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며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담대한 도전이냐, 사기냐.’ 지난 16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중장기 회사 비전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향후 10년간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셀트리온 ‘비전 2030’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였다. 한쪽에서는 “(서 회장이) 지금껏 회사를 키워온 걸 보면 믿음이 간다. 진정한 기업가다”고 추켜세웠다. 다른 쪽에서는 “매출 1조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그런 거액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며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논쟁은 바이오업계로 옮아갔다. 관전 포인트는 조금 달랐다. 투자 실현 가능성보다는 “10년 뒤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는 서 회장의 포부가 화두였다. 허무맹랑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인들에겐 확실한 자극제가 됐다. 한결같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글로벌 넘버원’이 제약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였다.
글로벌 넘버원의 꿈
서 회장의 앵커기업론도 화제에 올랐다. 리딩 기업이 스스로의 발전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원부자재산업을 키운 것처럼 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갔던 성장 궤적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독일 등 해외에 의존하는 핵심 바이오 원자재와 부품을 국산화해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업계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비전 2030의 실현은 셀트리온의 사업 성공에 전적으로 달렸다. 서 회장의 말대로 앞으로 출시할 20여 개 제품이 잇따라 성공해 2030년까지 누적 영업이익 80조원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 영업이익의 약 40%인 30조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순조롭게 10조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는 않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까지 뛰어들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같은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동시다발적인 신약 개발도 그렇다.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후보물질이 실제 판매될 확률은 1%밖에 안 될 정도로 신약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K바이오 도약 계기 돼야
그렇다고 서 회장의 도전을 회의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서 회장은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에서 접시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가의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풀리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무작정 창업했고 온갖 시련 끝에 결국 세계 바이오시밀러 1위가 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는 전례없는 기록이다. 게다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제품 가운데 기대작도 한둘이 아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램시마SC가 대표적이다.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를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로 바꾼 제품이다.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연매출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기업들이 움츠려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은 인보사의 성분 오류, 삼성바이오의 검찰 수사 등으로 뒤숭숭하다. 이런 와중에 나온 서 회장의 담대한 도전장은 바이오업계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K바이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