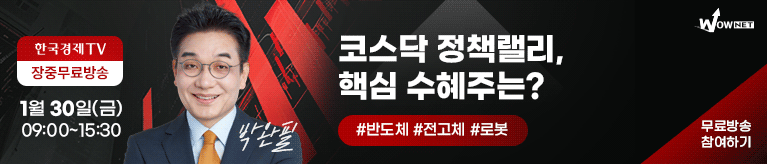최근 유아의 TV,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안경을 쓰는 듯 하다.
하지만 평소 스마트폰을 많이 쥐여준 것도 아니고 바늘이나 귀걸이 침 등이 떨어졌을 때 "엄마 여?어요" 누구보다 먼저 찾아주던 아이였기 때문에 시력 걱정을 내 아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뒤 담임선생님은 알림장을 프린트해서 반 전체 아이들의 공책에 붙여가게 했다. 어느 날 알림장에 "교실에서 칠판이 안 보일 정도면 안과에 가봐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똑같은 내용은 두 달 후 전체 알림에 또 있었다.
속으로 '반에 시력이 안 좋은 아이가 있나 보네'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반 친구 엄마가 통화를 하다가 "참 ○○이 시력 안 좋다던데 괜찮아요?"하고 물어왔다.
"응? 우리 ○○이가 왜?"
"우리 아이 말이 ○○이가 교실에서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이 안과 가보라고 했다던데"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다.
그날 하교 한 아이를 붙잡고 "너 칠판 잘 안 보여?"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아이는 "그렇다"고 말했다.
아뿔싸. 담임선생님이 전체 알림장에 적어놓았던 '시력이 안 좋은 아이'가 바로 너였단 말이니?
아이는 한 번도 집에 와서 칠판이 안 보인다거나 선생님이 안과에 가보라고 했다는 말을 내게 하지 않았었다. 마냥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아이 말도 믿기지 않아서 당장 다음 날 아이 손을 붙잡고 안과에 갔다.
시력 검사한다고 한 눈씩 가리고 숫자판 짚는데 아이 입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가 이어졌다.

제일 위에 큰 숫자 4가 안보인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 시력 검사를 미리 안 했었냐고 책망하시며 처음 안과를 찾은 아이 치고는 시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라고 하셨다.
풀썩.
내 무관심 때문에 아이 시력이 이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몰랐다는 자책감이 몰려왔다.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나 약 등을 먹이면 좀 나을까요?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하면 안되고 계속 써야 하는건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계속 써도 나빠지고 안써도 나빠집니다. 시력은 유전이에요. TV를 많이 보고 책 보고 한다고 더 나빠지지는 않아요."
단호박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힘만 빠져서 처방을 들고 안경점으로 갔다.
아이는 안경 쓰기 싫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6살인 둘째 아이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시력이 좋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수시로 안과 검진을 받게 될 터였다.

6개월마다 치아 건강에만 신경썼지 미취학 아이를 데리고 안과도 주기적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은 진정 몰랐다.
한 번 안경을 쓰게 된 아이는 성장이 빠른 만큼이나 시력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신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걸 잘 모르는 걸 왜일까 찾아봤다.
0에 가깝던 신생아의 시력이 6개월 땐 0.1, 2세 때 0.3이 되고, 6~7세 정도에 1.0의 정상시력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아이들 스스로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약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생후 1개월, 3세, 입학 전 등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미취학 때부터 신경썼다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력관리에 소홀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안경을 처음 맞추고 나오자마자 길거리 간판들을 보면서 "와~. 엄마 저 멀리 글씨도 다 보여요"하며 줄줄 읽어내는 아이를 보니 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처럼 무심한 부모가 다시는 없길 바라며 눈물로 글을 맺는다.

#워킹맘의 육아에세이 '못된 엄마 현실 육아'는 네이버 부모i 판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포스트를 구독하시면 업데이트 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