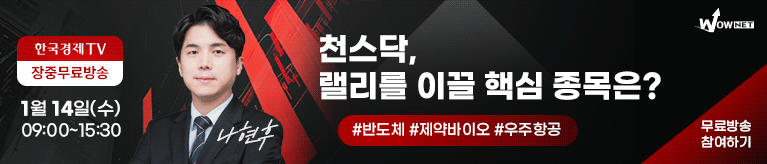[ 유병연 기자 ]
 누구는 투자라 하고, 누구는 투기라 한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경제학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건 난제다. 경제학자들은 실수요인가 가수요인가,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효용 창출 행위인가 아니면 자본이득을 챙기는 행위인가 등 갖가지 이론적 잣대를 동원한다. 하지만 아직껏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구분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는 투자라 하고, 누구는 투기라 한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경제학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건 난제다. 경제학자들은 실수요인가 가수요인가,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효용 창출 행위인가 아니면 자본이득을 챙기는 행위인가 등 갖가지 이론적 잣대를 동원한다. 하지만 아직껏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구분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기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여전한 논쟁거리다.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인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투기가 발생하는 것인지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란이다. 소득 증가나 교육열, 정책 학습 등 외생적 변수로 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고 투기는 그 결과라는 주장도 많다. 투기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면 투기 억제가 답이다. 그러나 투기가 가격 상승 기대의 결과라면 투기 억제는 대증요법으로 전락하고 만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가수요’와 ‘투기’만 골라내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애당초 공염불이요, 신기루 잡기인지도 모른다.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원리,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믿는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처방에 따라 정책을 쓴다.
반면 시장 불신론자들은 가격이 급등한 시장을 ‘비정상’ ‘비합리’로 규정한다. 특정 시점의 불균형이 눈에 거슬리면 ‘시장 실패’로 낙인찍고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화살을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 하라”(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며 시장을 겁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부르는 정책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아이러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파상 공세를 펼 때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똘똘한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 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전 대변인은 물러나면서 “아내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시장을 잡겠다는 청와대의 결기 어린 정책이 청와대 핵심 인사의 안방에서조차 안 먹힌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등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위해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 못할 최저임금 인상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의 팔을 비트는 정책도 모두 부작용을 키울 뿐이다. 실패를 덮기 위한 정책은 더 큰 실패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명제가 후생경제학의 핵심 정리다.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원래 의도와 달리 비용만 늘린 채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하는 이유기도 하다.
‘시장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라.’ 정권 핵심 인사의 잇단 낙마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이다.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