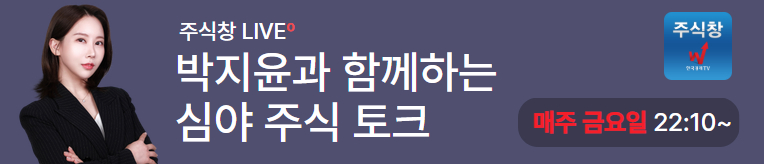공정위 "끝까지 안고치면 檢고발"
[ 임현우 기자 ] 구글의 콧대는 이번에도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조항들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자진 시정한 반면 구글은 절반만 수용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외 4대 대형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한 약관 점검에서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각각 5개, 네이버는 1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 세 업체는 공정위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은 자진 시정을 약속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약관 반영까지 마쳤다.
구글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8개 조항을 지적받았다. 구글은 이 중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계속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 4개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4개 조항은 스스로 고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권고를 60일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글 측은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선 “수정할 뜻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과 함께 이미 고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조항 중 ‘일방적 콘텐츠 삭제’는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거센 사항이다. 어린이나 여성들이 찍은 방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단되는가 하면 역사 왜곡,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명백한 콘텐츠는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한다. 구글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의견만 밝힐 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처럼 운영했다간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약관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용자들이 한 번쯤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카카오는 2016년 7월 ‘쉬운 용어(plain language)’라는 원칙을 도입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카카오 이용약관 제1장의 이름은 ‘환영합니다!’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약관을 읽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카카오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친근한 서술이 눈길을 끈다. 번역기로 돌린 듯한 해외 업체 약관과 비교하면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약관은 모두 원고지 60장 분량을 넘는다. 겉모습은 친절하게 바뀌었지만 내용 면에선 여전히 ‘포털이 갑’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카카오는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네이버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등 구글과 똑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