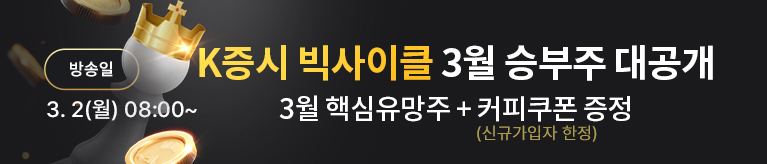원인은 복합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겨운데 생활물가는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지 되묻게 만들었다. 집값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개편,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지출도 결국에는 청년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란 불만이 팽배하다. 그러니 정부의 대북정책 치중, 양심적 병역거부 합법화 등의 논란거리에 더 민감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으면 이토록 좌절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엔진이 꺼져 가는데 정부 정책은 경제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정석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일자리 쇼크 대책이란 게 고작 ‘빈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기 알바 수준이라니 더 허탈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한국과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인 일본의 상반된 현실이 대비된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사토리(달관)세대’ 같은 우울한 신조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일신한 것은 경제 활성화였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일자리가 남아돌 정도로 확 바뀌었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한국 청년들에겐 부럽기 만한 얘기일 것이다.
반면 한국의 정치는 임기 뒤에야 어찌 되건,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쏟아낸다. 청년층은 투표율이 낮고, 세력화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도 못할 것으로 보는 탓일까. 무엇이 청년을 좌절시키는지, 모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때다. 청년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