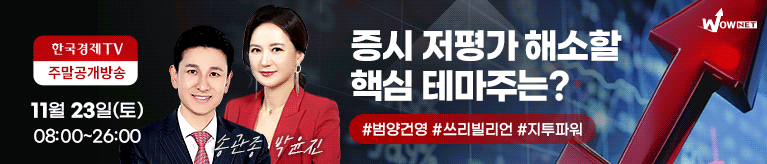[ 허원순 기자 ]
 길이 65㎝ 고무줄의 23㎝ 지점에 표시를 해 둔다고 가정해보자. 이 줄을 80㎝로 늘이면 23㎝ 지점 표시는 28㎝에 붙는다. 100㎝로 늘리면 35㎝ 위치에 놓인다. 비례적으로는 모두 같은 위치다. 고무줄 길이를 인간 수명으로, 표시 지점을 결혼 연령으로 바꿔 보자.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시대에는 17~18세 결혼도 조혼(早婚)이 아니었다. 생애주기로 보면 100세 시대의 35세와 같다.
길이 65㎝ 고무줄의 23㎝ 지점에 표시를 해 둔다고 가정해보자. 이 줄을 80㎝로 늘이면 23㎝ 지점 표시는 28㎝에 붙는다. 100㎝로 늘리면 35㎝ 위치에 놓인다. 비례적으로는 모두 같은 위치다. 고무줄 길이를 인간 수명으로, 표시 지점을 결혼 연령으로 바꿔 보자.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시대에는 17~18세 결혼도 조혼(早婚)이 아니었다. 생애주기로 보면 100세 시대의 35세와 같다.만혼(晩婚)에 대한 기성세대 걱정이 크지만 늘어난 수명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추세다. 인류의 진화나 생존의 최적화가 혼인적령기 변화에서도 집단지성처럼 나타난 것일까. 물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결혼에 앞서 준비할 게 많아진 것도 만혼과 비혼(非婚)을 재촉했을 것이다.
만혼과 비혼, 저출산은 맞물려간다. 현대 국가의 고민거리다. 비혼과 초(超)저출산율이 만혼보다 더 큰 숙제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다급한 발등의 불이다. 비혼도, 저출산도 ‘결혼’을 전제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결혼제도의 효용성 급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족의 해체에서도 ‘제3의 길’이 나올 수 있다. 남녀 커플의 생활양식에는 결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동거도 있고, 법정에서 곧잘 다툼거리가 되는 사실혼도 있다.
결혼제도에 관한 한 프랑스에 시사점이 많다. 사르트르-보부아르 커플이 계약 결혼을 한 게 1929년이었다. 이들은 2년간 계약을 끝낸 뒤 사실상 종신계약화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4명의 자녀에 알려진 동거인도 여럿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결혼 경력이 없다. 부인이 24세 연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 부부도 범상치 않다. 커플제도의 선진국답게 프랑스에는 팍스(PACs·시민연대협약)라는 법적 지위가 있다. 출산 육아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결혼 부부만큼 정부 지원이 따르는 동거형태다. 결혼 외에, 동성애자 간의 ‘시빌 파트너십’ 제도를 법제화해 온 영국이 지난달 이성 간 커플에도 이 관계를 인정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는 급변하고 있는 한국인의 결혼관을 잘 보여줬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이하(48%)로 떨어졌고, ‘비혼 동거도 괜찮다’는 56%에 달했다. 비혼 시대에 맞춰 혼인과 가족관련 법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해졌다. 결혼, 사실혼, 단순 동거 커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문제부터 공론화해 나갈 때다. ‘잘난 커플만 결혼한다’는 판이니, 출산 보육에만 지원을 집중하다가는 “정부가 청춘의 양극화를 재촉한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도 비혼족에게 들려주고픈 말이 있다.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2세를 생산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다. 사랑이라는 최면제가 그래서 있다.”(복거일)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