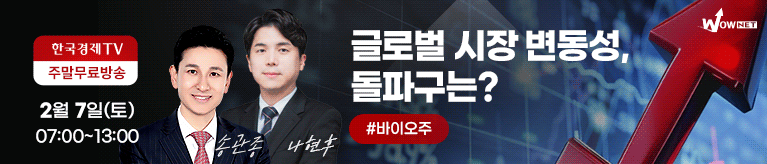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 허원순 기자 ]
 세금은 주권 국가의 중요한 요소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잣대도 된다. 정파의 좌우 성향을 분석할 때도 세금문제를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의 행태만 봐도 강압적 정권인지 정말로 납세자를 아끼는 정부인지 어느 정도 파악된다. 세정(稅政)이 선진행정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금은 주권 국가의 중요한 요소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잣대도 된다. 정파의 좌우 성향을 분석할 때도 세금문제를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의 행태만 봐도 강압적 정권인지 정말로 납세자를 아끼는 정부인지 어느 정도 파악된다. 세정(稅政)이 선진행정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도입하자고 주장해온 ‘디지털세’ 부과 논쟁에도 세금의 이런 속성들이 반영돼 있다. 최근 영국 재무장관이 “2020년부터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2%를 디지털세금으로 물리겠다”고 하면서 디지털세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른바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IT 공룡의 주력 사업모델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매출이 생기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게 특징이다.
기업이 돈 버는 곳과 플랫폼 서버나 본사 위치가 다르다는 특성이 디지털세 논쟁에서 주요 쟁점이다. 더구나 매출만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인 데다 법인세와 별도로 걷는 것이다 보니 해당 기업들이 반발할 만도 하다. 미국은 상공회의소 재무부 의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조세협약 위반”이라고 반격하며 여차하면 ‘세금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국가 간 조세협정 문제는 우리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안 낸다”는 국회의원들 질타가 쏟아질 때 한·미 조세조약이 현실적 벽으로 지적됐다. 그렇다고 이중과세를 피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며, 상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이 조약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디지털세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적극 나선 일종의 ‘미래세’다. 인터넷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로 이행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건너야 할 강이다.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경제 행위에 대해 특정 국가의 과세 주권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미칠 수 있는지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 발굴과 과세 차원이라면 로봇세도 빼놓을 수 없다. 빌 게이츠가 “로봇의 노동에도 과세하자”고 주장하며 힘을 실었고, 유럽의 좌파 식자들이 가세하면서 유럽의회에서는 법안 초안도 만들어졌다. 로봇은 소득세를 내는 인간과 같은 권리·의무가 없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근래 국내에서도 로봇세 주장은 낯설지 않다.
디지털세도 로봇세도 기술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도 쉽게 꺼지지 않을 불씨다. 시대변화에 따라 이런 미래세가 필요하다면 변한 세상에 맞춰 ‘과거세’도 정비하는 게 맞다. 국내에서는 기업 승계를 막는 상속세가 그런 것 아닐까.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