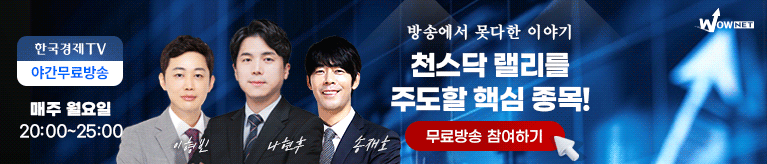[ 권영설 기자 ]
 ‘업(業)의 정의’는 한동안 유행한 경영 화두다. 한 대기업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호텔이라는 업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모두들 서비스업, 요식업, 패션업 등으로 얘기했다가 경을 쳤다는 얘기도 돌았다. 당시 그 회장이 정답이라고 밝힌 것은 ‘부동산업’이었다고 한다.
‘업(業)의 정의’는 한동안 유행한 경영 화두다. 한 대기업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호텔이라는 업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모두들 서비스업, 요식업, 패션업 등으로 얘기했다가 경을 쳤다는 얘기도 돌았다. 당시 그 회장이 정답이라고 밝힌 것은 ‘부동산업’이었다고 한다.미래에 요지가 될 땅을 골라 그곳을 미리 차지하는 것이 호텔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예전에는 서비스업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입지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라는 질책이었을 수도 있다.
산업 관행에 갇히면 사양길로
업의 정의를 자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고객이 달라지고, 시장이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업종에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나눠 가질 파이가 작아지고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다. 어떤 산업이든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블루오션전략의 창시자인 김위찬 프랑스 인시아드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에 대해 ‘시장의 범위를 재구축하라(reconstruct market boundaries)’고 강조한다.
이미 붉은 피가 넘치는 우리 업종 건너편의 다른 업종을 참조하고 더 나아가 새 산업을 창출할 비전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노키아가 어떻게 하면 더 품질이 좋은 휴대폰을 또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이, 애플은 앱스토어산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개척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낸 덕분이었다.
생각해보면 21세기 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은 전혀 다른 새 업종을 개척한 기업들이다. 아마존을 보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을 깨고 나와 온라인 서점, 나아가 온라인 유통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 모든 유통을 평정하고 있다. 미용실 체인들이 더 럭셔리한 헤어스타일과 염색, 파마 서비스에 집중할 때 드라이바(DryBar)는 ‘헤어 드라이 서비스’라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
특히 침체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산업군에 속해 있다면, 또 경쟁사들 모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기존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경기를 벌이려고 해야 옳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 IBM이 컨설팅 서비스로 전환한 것을 보라.
새 업종 창출 의지가 돌파구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들어보자.
“인생이 저기 있고 당신은 단지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이 업종 속에서만 사업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업종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은 그러나 매일 매월 매년 주어진 목표에 매진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가질 수 없는 문제 의식이다.
이런 통찰의 간략 버전 가운데 하나가 ‘이업종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 업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당연시되는 것들이 있다. 대형병원을 예로 들면 여전히 발레파킹 서비스가 없다. 호텔은 물론 갈빗집에서도 손님들이 경험하는 서비스인데도 말이다.
회사를 다른 업종으로 옮길 수 없다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전반을 새롭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새로운 시장도 열릴 수 있다.
최근 들어 경기 상황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전략 마인드다. 우리 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과연 그런가. 몇 번이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