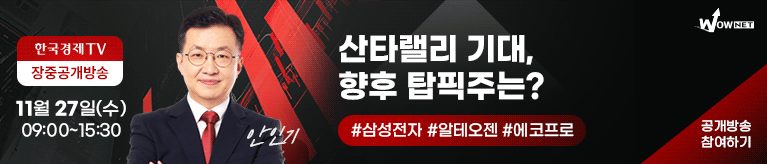비영리기관은 자칫하면 혁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닌 데다 시장으로부터의 압박이 없기 때문이다. 급여가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적다는 핑계로 새로운 일을 벌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기관은 자칫하면 혁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닌 데다 시장으로부터의 압박이 없기 때문이다. 급여가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적다는 핑계로 새로운 일을 벌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조직은 최소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면 쪼그라들어 망하고 결국 존재 의미를 잃는다. 당연히 비영리기관도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가며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혁신이다.
많은 이들이 비영리기관은 경영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100년 남짓한 현대 경영의 역사를 보면 애초에 경영이 처음 적용된 곳이 바로 비영리기관이었다. ‘과학적 관리’라는 용어를 만든 테일러가 1912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과학적 관리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 것은 비영리단체인 메이요클리닉이었다.
팬을 활용해 모금한 '빨간코'
경영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비영리기관이야말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혁신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의 코믹릴리프 사례는 비영리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믹릴리프는 1985년 설립됐는데 당시 영국의 자선모금기관은 이미 레드오션에 빠져 있었다. 런던에만 암환자를 위한 자선단체가 600개, 노숙자를 위한 단체도 200개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선모금단체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다.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중장년들을 주된 목표로 1년 내내 개별 권유에 매달렸다. 그럴듯한 기부행사를 열며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기존 기부자를 계속 괴롭히는 동시에 비용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레드오션 시장이었던 셈이다.
모바일·소셜은 최고의 기회
코믹릴리프는 출범부터 전혀 다른 가치혁신을 시도했다. 부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기부하도록 만드는 대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했다. 방식은 간단했다. 수다쟁이라고 소문난 런던의 한 여행사 직원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24시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도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500파운드를 모금하겠다고 선언했다. 누구든지 이 도전을 후원하려면 단돈 1파운드(약 1500원)짜리 플라스틱 ‘빨간코’를 사면 된다. 유치원 아이까지도 이 모금 운동에 재미로 쉽게 동참할 수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소싱’을 시도한 셈이다.
유명 스타들이 가세하면서 빨간코 이벤트는 금방 알려졌다. 이들이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해 빨간코 모금을 선언하면 사람들은 빨간코를 사는 것으로 후원했다. 코믹릴리프는 ‘기부자’가 아니라 ‘팬’을 확보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었다. 1988년 처음 열린 ‘빨간코의 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유명인이 참여했다. BBC에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을 3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150만파운드가 모금됐다.
비영리단체는 이익이 아니라 사명감이 존재 이유다. 그러나 결실 없이는 사명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 출발점은 익숙한 레드오션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비영리기관들이 시장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오히려 더 약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덕분에 글로벌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 놀라운 혁신을 시도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펼쳐졌다는 얘기다.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