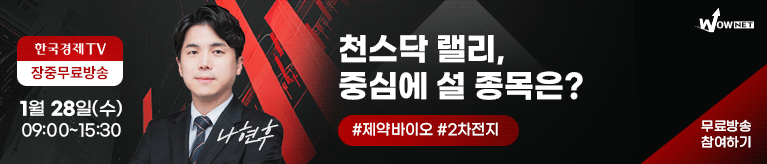갈 길 먼 창의·융합교육 (2) 지지부진한 대학 개혁
고려대 '無계열학과' 실험
대학 정원 규제에 백지화
학과 통폐합 '학부제' 전환도
학내 기득권 세력에 밀려 실패
등록금·정원 통제 당하는 대학들
고등교육 위기에도 변화 쉽지않아
산업현장선 "인재 없다" 불만
[ 김동윤 기자 ]

세계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독일 아헨공대 등 글로벌 일류대학들도 ‘뒤처지면 한순간에 추락하고 만다’는 위기감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규제와 기득권에 갇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일류대학들 “한눈 팔면 뒤처져”
 스탠퍼드대는 세계대학평가에서 매년 1,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초일류다. 이 대학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선두주자다. 스탠퍼드대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design thinking)’을 가르치는 ‘디스쿨(d.school)’로 돌풍을 몰고 왔다. 혁신과 창조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개념 커리큘럼이다. 전공과 나이에 상관없이 등록해 ‘문제해결 중심 학습(PBL)’을 체험할 수 있다. 구글, 제너럴일렉트릭(GE), P&G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디스쿨을 찾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세계대학평가에서 매년 1,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초일류다. 이 대학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선두주자다. 스탠퍼드대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design thinking)’을 가르치는 ‘디스쿨(d.school)’로 돌풍을 몰고 왔다. 혁신과 창조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개념 커리큘럼이다. 전공과 나이에 상관없이 등록해 ‘문제해결 중심 학습(PBL)’을 체험할 수 있다. 구글, 제너럴일렉트릭(GE), P&G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디스쿨을 찾고 있다.‘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공대는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모델을 선보였다. 학내에 19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학·기업·연구소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케임브리지대 역시 케임브리지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혁신적인 학내 연구 성과의 상업화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 도쿄대는 최근 ‘VR교육센터’를 세웠다. 공학뿐만 아니라 의학, 예술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VR)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학생과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개혁 시도 줄줄이 좌절
 변화를 모색하려는 한국 대학들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실정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015년 3월 취임 후 ‘미래대학’이란 이름으로 무계열학과 신설을 추진했다.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원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확대가 불가능해 미래대학을 만들려면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했다. 변화를 주저하는 교수들이 반대하고, 총학생회가 대학 본관 점거농성까지 벌이자 염 총장은 결국 계획 철회를 발표하고 말았다. 한 고려대 교수는 “규제와 대학 구성원들의 기득권 옹호 때문에 개혁이 좌절됐다”고 아쉬워했다.
변화를 모색하려는 한국 대학들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실정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015년 3월 취임 후 ‘미래대학’이란 이름으로 무계열학과 신설을 추진했다.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원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확대가 불가능해 미래대학을 만들려면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했다. 변화를 주저하는 교수들이 반대하고, 총학생회가 대학 본관 점거농성까지 벌이자 염 총장은 결국 계획 철회를 발표하고 말았다. 한 고려대 교수는 “규제와 대학 구성원들의 기득권 옹호 때문에 개혁이 좌절됐다”고 아쉬워했다.다른 대학들의 노력도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학부제가 대표적이다. 주요 대학은 2000년을 전후해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는 학부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2010년 무렵부터 차례로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부제 실험은 중단되고 말았다. 한 국립대 공대 교수는 “융합 인재 양성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이 학과 단위로 구축된 탓에 결국 학과 체제로 회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학에 자율성 줘야
실패가 쌓이면서 국내 대학은 여전히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물러 있다. ‘스펙은 화려한데 막상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마땅한 인재를 찾기 힘들다’는 불만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대학에 권한과 자율성을 준 뒤 성과를 따져 차등 지원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학사회는 기본적으로 혁신에 필요한 이견 조정이 어려운 속성이 있다. 여기에다 등록금과 정원 등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더해지면 변화보다 안주를 택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학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기득권도 장애물로 거론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역설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야 대학사회가 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자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100만원으로 "40억" 번 남성 "이것"받아 투자했어!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