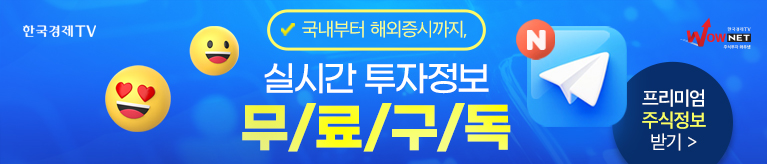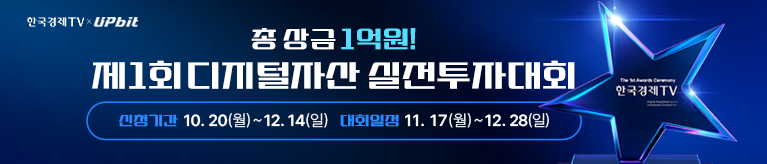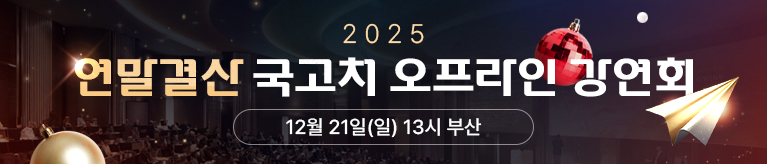정치는 모든 게 타이밍이다. 유럽연합(EU)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디지털세(digital tax)’가 하필이면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과 맞물렸다. EU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디지털세 논의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디지털세를 통해 EU 통합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
정치는 모든 게 타이밍이다. 유럽연합(EU)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디지털세(digital tax)’가 하필이면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과 맞물렸다. EU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디지털세 논의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디지털세를 통해 EU 통합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디지털세는 인터넷 대기업이 유럽에서 올린 이익이 아니라 매출(revenue)에 대해 3%를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이 개인정보 판매, 구독료, 광고에서 얻는 매출에 대해 연간 50억유로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크게 보면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지기반과세(DBCFT)’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디지털세는 인터넷 대기업이 유럽에서 올린 이익이 아니라 매출(revenue)에 대해 3%를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이 개인정보 판매, 구독료, 광고에서 얻는 매출에 대해 연간 50억유로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크게 보면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지기반과세(DBCFT)’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독일과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독일은 디지털세 불똥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에 튈까 우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신했을 때 이들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가 무역전쟁과 맞물리면 미국과 중국이 독일 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메르켈 총리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지지한다”면서도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EU가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등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정치적 입지 강화다. 밖으로는 유럽 디지털산업 수호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피난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다. 디지털세가 28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독일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로서 수혜를 누려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역시 EU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 배경엔 미국에 디지털 패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유럽의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IT 공룡들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 기업 중에선 로열더치셸(석유)과 네슬레(식품)가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을 뿐 IT 기업은 전무하다.
미국은 EU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맞서 지난해 말 본국 송금세 인하를 결정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잉여금을 본국으로 유인해 일자리 증가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파티흐 구베넌 미네소타대 교수팀에 따르면 해외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왔다면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2조6000억달러 상당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세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데이터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비지 기반 과세체계로 변화하려는 흐름은 이미 시작했다. 에릭 포스너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최신 저서 《급진적인 시장(Radical Market)》에서 “데이터는 이용자가 생산한 소유물”이라며 시장이 데이터 소유자에게 정당한 값을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 흐름이 두려운 것은 미국과 독일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기에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과세당국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내게 될 세금과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내야 할 세금의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