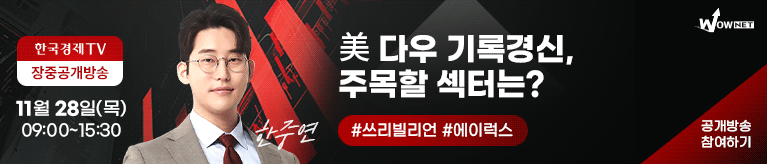취지와 달리 노동개혁 변수 될 수도
백승현 지식사회부 차장 argos@hankyung.com
 “근로자이사(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노동존중특별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근로자이사(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노동존중특별시’의 핵심 정책입니다.”올해 1월 서울시 산하기관 최초이자 국내 첫 근로자이사 임명식이 열린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4월 박 시장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2곳에 16명의 근로자이사가 탄생했다.
‘근로자’와 ‘이사’라는 쉬이 병립하기 어려울 듯한 단어의 파급력은 컸다. 노동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은 자연스럽게 논의의 장을 넓혔다. “서울시의 친노동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박 시장의 바람대로 최근 근로자이사제 논란은 서울시를 떠나 큰 무대로 옮겨졌다. 그것도 중앙부처 공공부문을 건너뛰고 민간부문으로 직행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는 근로자 사외이사 선임안이 올라왔다. 선임안은 부결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사 합의가 먼저”라며 급히 불을 끄긴 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 금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시행안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2011년이었다. 2009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됐다. 복수노조란 말 그대로 한 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를 나와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시에도 논란은 컸다.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되면 잦은 교섭으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것보다 개별 근로자의 노동권과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양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다양한 노조의 출현으로 노조조직률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기대에 그쳤다. 양대 노총은 상대 조직이 구축해 놓은 사업장에 새 노조를 결성하는 식의 ‘조합원 빼오기’를 곳곳에서 벌였고, 경영마인드가 건전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어용노조를 조직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노동계 요구에 따라 어렵게 첫 단추를 끼운 근로자이사제를 두고 복수노조를 떠올리는 것은 과한 것일까. 근로자이사제도 전반에 밝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하기관 곳곳에서 근로자이사와 노조의 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직원들로선 노조와 근로자이사 어느 쪽을 통해야 근무여건이 더 좋아지고, 민원이 해결될지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는 등 노동계의 전폭적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숙제는 대통령 공약대로 명확하다. 노조 조직률 10% 수준의 양대 노총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니라 90%에 달하는 미조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문제가 우선이어야 한다. 집권 초기 바람처럼 몰아치고 있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대상에는 노동 기득권 세력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근로자이사제도가 취지대로 노사 상생의 단초가 될지, 경영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할지, 아니면 나아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트로이 목마’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차장 argos@hankyung.com